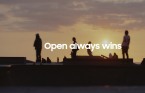동행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미처 말하지도 않은 궁금함을 벌써 알아채시고는 “예쁘지? 오동나무야.”라고 스쳐가듯 말씀하신다.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 이름 하나 모른다는 게 기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르면 용감하다’고 했다던가. 세상에는 아직도 배워나가야 할 것들 투성이라는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내 주변의 것들을 찬찬히 살피며 끊임없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이리라.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처럼 생기발랄한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어 학교는 생동한다. 졸업한 아이들이 잊지 않고 교정에 찾아와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할 때, 학생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겨 어느새 크게 성장한 내면을 마주할 때, 맑고 순수한 눈망울로 배움에 대한 열의를 보일 때 등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셀 수 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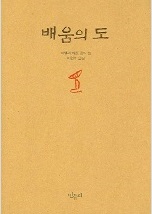
노자의 도덕경 81장을 ‘배움’이라는 주제로 다시 풀어쓴 이 책을 읽으며, 부끄러운 나의 자화상을, 교사로서 가졌던 초심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본다.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에 있다. 하지만 나의 큰 희망은 사람에 있다.’(윌리암 부스)
교단에 서는 날을 그토록 갈망하던 시절,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이라는 책을 읽다가 마음의 울림을 얻어 메모해 둔 구절이다. ‘교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생의 마지막인양 관심을 기울이라고”한 모리 교수의 말처럼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하겠다는 나의 다짐은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서
그대가 누구를 가르칠 때,
그 일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장애물들 앞에서 부드러울 수 있는가?
영문 모를 어둠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밝게 볼 수 있는가?
남을 잡아끌지 않으면서 친절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가?
길을 뻔히 보면서도 남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가?
낳아서 기르는 방식으로 가르치기를 배워라.
손에 넣어 잡지 않고 가르치기를 배워라.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기를 배워라.
다스리려 하지 않고서 가르치기, 한 번 해볼 만한 일이다.
<‘배움의 도’, p.20에서 인용>
비단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닐 터이다.
이번 주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택함을 이끌어줄 고전의 그윽함을 향유해보길 권한다.
한소진 덕신고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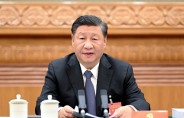














![[모바일 랭킹] 작혼, '블루 아카이브' 컬래버 후 매출 119위→11...](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2016003305766c5fa75ef86122545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