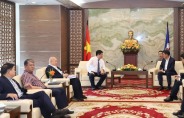이처럼 분화한 것의 예가 또 있다. 바로 관습과 윤리와 법이다. 동서양 모두 고대에는 관습과 윤리와 법이 분화되지 않은 규범으로 존재했으며 그 뿌리는 종교적 계율인 경우가 많았다. ‘황금률’도 종교적 관습이자, 윤리이자, 법이었다. 오늘날 관습과 윤리와 법은 충분히 분화하여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규범이기 때문에 상호보완하면서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혹시 그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196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달러 미만이었으나 2010년대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초과했고 50년 동안 소득은 100배 이상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늘어나면서 부정·불량식품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규모화됐으며 위해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익명의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거나 팔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익명의 불특정한 사람이 만들거나 파는 것을 사먹는다. 만들고 파는 사람과 먹는 사람 사이의 매개체는 ‘금전’일 뿐 음식이 ‘생명과 행복’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만들고 파는 사람의 ‘돈벌이’ 수단 또는 먹는 사람의 한 끼를 ‘때우는’ 수단으로 방향을 잘못 잡기 쉽다. 그 결과 생명을 해치거나 정의롭지 않은 행위가 증가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규나 주무기관의 위상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 법을 토대로 한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할 때다. 따라서 법에 치우쳤던 규범에 관습과 윤리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법만으로도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관습과 윤리가 제몫을 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관습은 각 지역의 ‘고유성’이 강해
세계화 시대에는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공유의 측면에서는 윤리가 관습은 물론 법보다도 더욱 적합하다. 왜냐하면 윤리는 보편적 이성을 근거로 성립하는 공통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 원리가 선행되기에 세계화의 시대에 차이나 차별 없이 거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법정신도 윤리가 몸에 배어야 배양된다. 이것이 음식 윤리가 법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제 태평하게 잠자는 윤리를 깨울 때이다.
식품학도는 어떤 전문인이 되어야 할까? 그는 단순히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일까? 아니다. 그는 ‘생명과 행복’을 주는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생명과 행복을 먹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음식을 만들거나 팔기 이전에 필요한 덕을 갖추어야 하고, 음식 윤리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며, 윤리적 판단 능력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터를 닦듯 과학기술 이론이나 관련 법규를 배우기 전에 음식 윤리를 먼저 배워야 한다. 음식 윤리도 생명의료 윤리나 공학 윤리처럼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이 탈진한 지금이 바로 식품학도에게 음식 윤리를 가르칠 때가 아닐까?
김석신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