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각종 정책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자가격리 등 셧다운 정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사망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언제쯤 코로나19 사태가 꺾일지, 경제는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미 언론의 진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일각에서 수 개월 이내에 경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재정과 경제는 몇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비용을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이 이제 초입에 들어서 그 파장을 진단할 수조차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은 수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발 3개월을 복기해 보면 백악관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게 된다고 WP는 보도했다.
문제는 앞으로 투입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앞으로도 5000억 달러(약610조원) 추가 투입에 의견을 좁히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1조 달러(약 112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재정적자가 곧 4조 달러(약 4882조 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이다.
기업이나 가계 대출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석유화학업체 엑슨모빌과 약국체인 월그린만 하더라도 앞으로 신용경색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우려한다.
문제는 끝도 없다.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은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향후 2년 동안 5조 달러(약 6105조 원) 상당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외신은 이같은 현상을 '잃어버린 일본의 10년'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미국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연방 정부와 50개주,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은 절대적인 세금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각종 어려움 중에서도 개인들이 겪을 고통이 가장 크다. 골드만삭스는 올 여름에 실업률이 15%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컬럼비아대학 연구팀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실업률 30%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빈곤율은 12%에서 19%로 상승하며, 이는 53년 만의 최악의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에서는 새로운 사업체를 꾸릴 의지도 없게 되고, 기업체는 쇠락에 빠지게 된다. 비즈니스 운용자금 확보는 어렵게 되고, 사람들은 저축이나 투자를 멀리하게 된다.
오랜 투쟁 끝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미국인들이 겪을 두려움은 남는다.
재정 악화 속에 경제활동 욕구는 감소하고,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 파탄 상황에 직면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경고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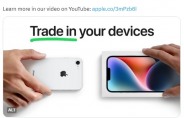














![[초점] 머스크, ‘사이버트럭 일시 생산 중단’ 이유 밝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911432006942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