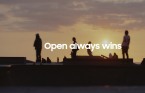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네 전무님!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회사 근처 무반(Moo Bahn)이라는 단독주택지구에 살면서 나무 심고 정원도 가꾸며 지냅니다. 쉬는 날에는 얼음과 맥주를 채운 아이스박스를 픽업트럭에 싣고 공원지구에 가서 타이만(灣)의 석양 노을도 즐기면 일품입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6월에 취업한 'MKT(가칭)'는 태국 방콕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파타야로 가는 길에 있는 '촌부리' 라는지역에 자리잡은 플라스틱 사출성형 전자부품회사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한국의 글로벌 가전제품 제조회사가 나와있으니 부품으로 자재를 제조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많다. 이 회사도 진출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직원들도 현지인 500여 명에 한국인 직원도 10여 명이다.
글로벌 기업에 고정 납품을 하다 보니 비교적 평온한 편이기는 하나 발전이나 성장에 도전하는 일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제법 당찬 의견도 피력했다.
"일은 어때?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이있어?"”라고 했더니, "제가 말씀 드리는 일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며 입사 후에있었던 일을 전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4년 여간 직장생활의 경험과 태국어를 공부한 게 감안돼 인사관리, 산업안전관리업무와 전산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어느 날 '대리님! 오늘 생산했다고 보고된 수량이 서류와 실제가 맞질 않다고 합니다'는보고를 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일 생산량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랫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고도 맞지 않고 자재도 맞지 않았다. 한술 더 떠 품질관리에서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다. 그런데 매일 수십 장의 보고서는 생성이 되고 있었다. 내용을 알고 보니 의미 없는 종이와 불신의 데이터일 뿐이었다. 새롭게 업무를 맡아 데이터를 모아 경영진에 보고하는 담당자로서 도저히 그냥 진행할 수가 없었다.
먼저,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서 '현장'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수 차례 현장을 찾아 협의하며 문제를 찾고 공정 전체를 보는 눈도 키워 나갔다. 책상머리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생산관리자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 반영했다. 시스템 구축 이후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도 결정적인 힘이 됐다.
둘째는 공정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위해 업무정의와 혁신을 병행했다. 이것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찾을 수가 있었다. 단기간에 산업의 이해 폭을 넓히고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을 이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8개월여간에 진행된 프로젝트로 제대로 된 숫자가 나와 경영진과 현장에서 공유하니 품질이나 생산성과 관련한 한 단계 높은 혁신의 방향성을 갖게 됐다.
다른 부서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이 과정을 통해 목표를 공감하고 생산성이 나아지며 현장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것에 크게 좋아했다고 한다. 리더가 제대로 동기만 부여하면 지역이나 인종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성과와 혁신, 그리고 직원 만족도가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 간 것이다. P대리도 단기간에 회사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한국인 직원이나 현지인 직원들과도 단숨에 가까워지는 기회를 얻었다.
현지에 진출한지 10년이 넘는 회사의 실상이 그 정도 밖에 안 된 것과 그러고도 무사한 것이 궁금했다. 나름대로 정리하는 식견이 좋았다. 글로벌 대기업의 발주에 따라 움직이니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며 기후에 따른 느긋한 문화, 일본식 문화로 변화에 둔감한 게 이유라고 했다. '한국 경영진이 그냥 보고 있더냐'고 물었더니 그는 "솔직히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제대로 현지어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특히 글을 읽고 글로 남기는 것에는 유난히 약하고 말로 지시로만 하는 게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마디 거들었다. "그런상황에서도 납품이 되고 살아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크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테니 재미 있겠다. 그러나, 조금만 한눈팔면 P대리도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둘의 대화가 조금 더 나갔다. "일본 회사의 진출이 워낙 견고해서 한국 기업이 자리잡기가 어렵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번 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 조금만 품질수준 높이고 단가가 합리적으로 만들면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가전회사나 일본 본사의 납품도 도전해 볼 만하다. 자동차가 전기차가 대세인 세상이 눈 앞에 있으니 가전회사의 부품을 자동차회사에도 팔아먹을 게 없을까? 식품이나 농산품 등에는?"
모처럼 주고 받은 대화가 재미있어서 마음 한켠이 벅찼다. 눈치를 챘는지 그는 "전무님! 하늘 길 풀리면 꼭 찾아 뵙겠습니다. 가서 식사 한 번 쏘겠습니다"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현장] AI컴퓨팅 전력소비 줄이기에 '사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1917582903842edf69f862c1182354136.jpg)














![[유럽 증시] 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유럽 3개국 지수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720184501291a6e8311f64218147901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