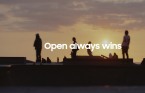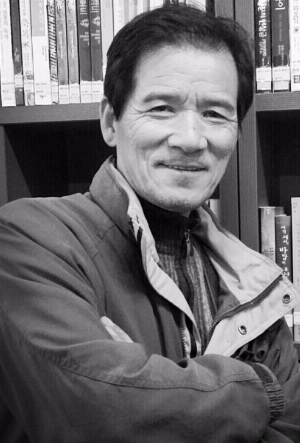
어느새 산책로 입구에 처져있던 바리케이드도 치워졌고 물이 범람하여 밀려온 쓰레기로 덮여 있던 자전거도로도 말끔히 치워져 있다. 천변엔 갈대와 풀들이 한쪽으로 쓸려 아직도 큰물이 지나간 흔적이 역력한데 많은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느 때처럼 산책하고 자전거를 탄다. 비에 젖어 지냈던 그간의 일들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상쾌하다. 그간의 우울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잠시 다리에 힘을 주어 속도를 높이다가 이내 자전거를 멈춘다. 나를 스치는 풍경들을 일별하며 그냥 지나치기엔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나를 멈춰 세운 것은 인동꽃이었다. 자전거도로 측벽을 타고 올라간 초록 덩굴 사이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인동덩굴의 개화 시기는 5~6월인데 더러는 이렇게 한여름에도 피어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처음엔 흰 꽃이 피었다가 수분을 한 뒤엔 노란색으로 변해 금은화로도 불리는 인동덩굴은 반 상록성이라 한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기도 하여 겨울은 견딘다는 뜻의 인동(忍冬)이란 이름을 얻었다.
수직의 벽을 타고 오른 인동덩굴이나 담쟁이덩굴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매번 놀라곤 한다. 덩굴식물 중에 특히 내가 좋아하는 꽃은 나팔꽃이다. 무엇이든 감고 올라가는 나팔꽃 덩굴은 유년 시절의 옛 고향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나무 울타리를 타고 올라 아침마다 활짝 피어 기상나팔을 불어대곤 했다. 그런가 하면 풀숲엔 노란 실을 마구 헝클어 놓은 듯한 실새삼도 눈에 띈다. 새삼은 다른 식물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한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잎은 퇴화하여 없고 꽃은 흰색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피는데 작은 꽃들이 모여 언뜻 보면 덩어리처럼 보인다. 비록 다른 식물에 얹혀살지만 새삼도 어엿한 숲의 일원이다.
걷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땐 보이지 않던 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온다. 쑥부쟁이 개망초, 달맞이꽃, 닭의장풀, 메꽃, 나팔꽃, 꽃범의꼬리, 나무수국, 무궁화, 벌개미취, 코스모스… 일일이 호명하기 힘들 만큼 많은 꽃이 나를 반긴다. ‘꽃의 화가’로 불리던 조지아 오키프의 말처럼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꽃을 보려 하지 않는다. 꽃을 알기 위해선 친구를 사귀듯 시간이 필요한데 바쁜 현대인에겐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자연은 가장 완벽하다’고 했던 칸트의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된다.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게 꽃의 세계요, 자연이다.
다시 자전거에 올라 무수(無愁)골을 거슬러 오른다. 큰물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암반 위를 흐르는 물은 거울처럼 맑고 물소리는 자못 흥겹기까지 하다. 이름처럼 근심이 없는 골짜기라서 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냇가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제 장마가 지났으니 한동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하지만 자연은 빠르게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런 자연을 보며 우리 또한 곧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겨나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백승훈 시인








































![[뉴욕증시] 엔비디아 10% 폭락에 나스닥지수 2% 급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2006032600384c35228d2f51751931501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