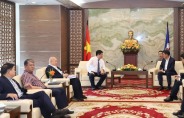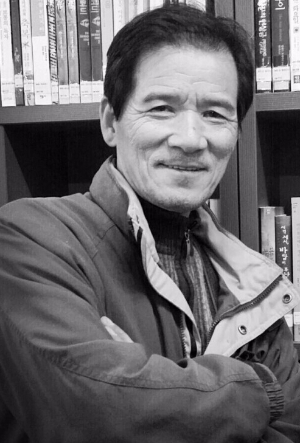
대숲이 빽빽해도 흐르는 물은 방해받지 않고, 산이 높아도 나는 구름은 거리끼지 않는다(竹密不妨流水過(죽밀부방유수과) 山高豈碍白雲飛(산고개애백운비)는 경봉스님의 선시처럼 제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시절의 오고 감을 막지는 못한다.
바람이 좋아 천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 단풍나무가 초록 터널을 이룬 둑길을 따라 걷는다. 양편으로 늘어서서 초록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산책로엔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들이 꽤 많다. 하나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수그러드는가 싶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가면도 오래 쓰면 얼굴이 된다는데 이러다가는 영영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잎 사이로 잘게 부서진 은빛 햇살들이 쏟아져 내린다. 단풍나무 잎은 하나같이 손가락 모양으로 깊게 갈라져 있다. 한자로는 결각(缺刻)이라고 한다. 단풍나무 잎이 갈라져 있는 까닭은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햇빛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너른 잎이 광합성에 유리할 것 같지만 식물들은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 깨달았다. 그리하여 잎의 크기를 줄이거나 잎을 가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 온 것이다. 단풍잎의 결각엔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운 정신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천천히 둑을 따라 걸으며 나무나 꽃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헤엄치는 쇠오리 가족과 돌 위에 우두커니 서서 햇볕에 젖은 날개를 말리고 있는 검은 가마우지 떼를 관찰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단풍나무 숲길을 걸으며, 천변을 걸으며 바라 본 파란 하늘에 눈이 시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 수풀 림(林)이란 한자는 나무와 나무가 서로 어깨를 겯고 숲을 이룬 형상을 하고 있다. 우리도 나무처럼 서로 의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야겠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