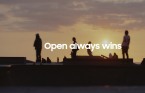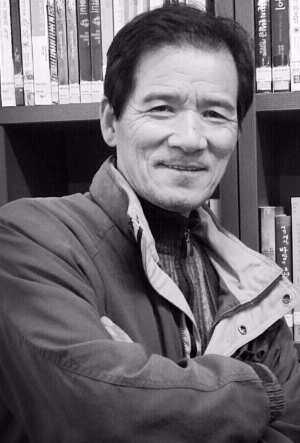
오갈 데가 마뜩치 않을 때 나는 소공원을 찾아가거나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다. 겨울은 나무가 잘 보이는 계절이다. 길을 걸으며 여름내 무성하던 잎들을 모두 내려놓고 묵상에 잠긴 듯한 나목(裸木)들을 찬찬히 살피곤 한다. 나무들이 달고 있는 열매들을 무연히 바라보거나 가지 끝에 겨울눈을 살피기도 하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보는 일이 지구의 한 페이지를 읽는 일이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기도 한다. 매서운 북풍을 견디며 서 있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채 고요히 서 있다. 조금의 숨김도 없이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나무들은 여느 계절의 모습보다 여유롭고 품위 있다. 우뚝한 나무둥치와 거칠 것 없이 사방으로 쭉쭉 뻗어 나간 곁가지들, 나무 끝 쪽의 수없이 많은 잔가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파란 하늘을 쓸고 있는 모습은 단아하기까지 하다.
곽재구 시인은 나무를 두고 '이렇게 등이 굽지 않은 언어들은 처음 보겠구나/ 이렇게 사납지 않은 마음의 길들은 처음 보겠구나'라고 했고, 미국의 시인 조이스 킬머는 '나무들'이란 시에서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으랴. 오직 신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다'고 노래했다. 잎을 지운 겨울나무들은 얼핏 보면 잠을 자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고요해 보이지만 기실 쉬지 않는 생명의 돌기를 계속하며 그들의 진지한 삶의 숨결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겨울이 깊어지고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더욱 반짝거리는 수피(樹皮)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잎을 지운 나무들의 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겨울눈이 있다.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겨울눈만 보고도 나무의 이름을 척척 알아맞힌다. 겨울눈은 잎 지는 나무들, 즉 낙엽수들이 이듬해 필 꽃이나 잎을 겨우내 잘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겨울눈은 '잎눈'과 '꽃눈' 두 가지가 있는데, 잎눈은 잎의 압축된 정보를, 꽃눈은 꽃의 압축된 정보를 간직한 작은 생명체이다. 대체로 잎눈은 뾰족하고 꽃눈은 둥글다. 겨울눈이라고 해서 겨울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작은 생명체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무들은 여름이나 가을 동안에 부지런히 겨울눈을 만들어 간직한 뒤 겨울을 맞이한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담장 너머 감나무 가지에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홍시가 붉다.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불을 켠 듯 붉은 홍시가 탐스러워 다가서는데 어디선가 직박구리 한 마리가 날아와 감나무에 앉더니 홍시를 쪼아댄다. 주위를 돌아보며 부지런히 홍시를 쪼아 먹는 직박구리를 보며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지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이 펼쳐진다는 뉴스를 보았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함께 힘을 내자'는 캠페인이라고 한다. 한 자리에 붙박인 채 추운 겨울을 견디는 겨울나무처럼 우리 모두 이 힘든 계절을 건너가야겠다. 나무들이 겨울눈을 간직하고 봄을 기다리듯 가슴엔 희망을 품고.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현장] AI컴퓨팅 전력소비 줄이기에 '사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1917582903842edf69f862c1182354136.jpg)














![[유럽 증시] 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유럽 3개국 지수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720184501291a6e8311f64218147901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