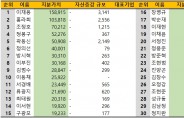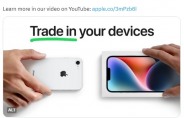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을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이 10일 경남 진주 시설안전공단 본사에서 정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해 치러졌다.
국토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은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현 이사장이 맡았다.
박 원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만든다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목적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제정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형식상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업무분야도 건설관리공사의 공사현장 감리업무와 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안전관리업무를 통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설안전공단이 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합병하는 성격이 강해 향후 건설관리공사 출신 직원들과의 융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은 통합기관 출범 이후에도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과 '신설 5개 지사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관리공사 노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안전관리라는 동일가치의 공적업무를 수행함에도, 건설관리공사 직급별 임금이 시설안전공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관리공사 전 직원의 직급을 1~2급 하향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맡아 온 특성상 건설관리공사 직원 대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전국 5개 지사로 배치되는데, 지사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근무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관리공사 노조는 지난 9월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졸속적 국토안전관리원 일원화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정상철 건설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직전 주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건설관리공사 노조 관계자는 "1인시위, 탄원서 제출 등에도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일까지 노조측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은 거의 없다"며 "통합기관 출범 이후에도 기존 두 기관의 노조 통합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합 이후에도 건설관리공사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리업무 등 건설관리공사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시설안전공단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똑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며 "같은 기관 내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관리공사 직원 직급을 부당하게 강등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