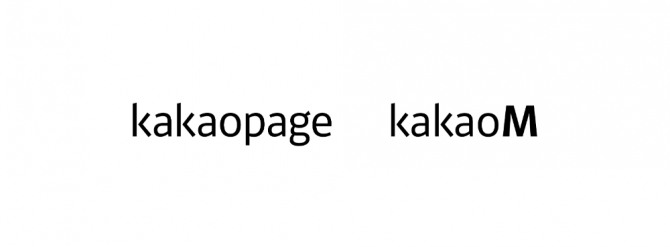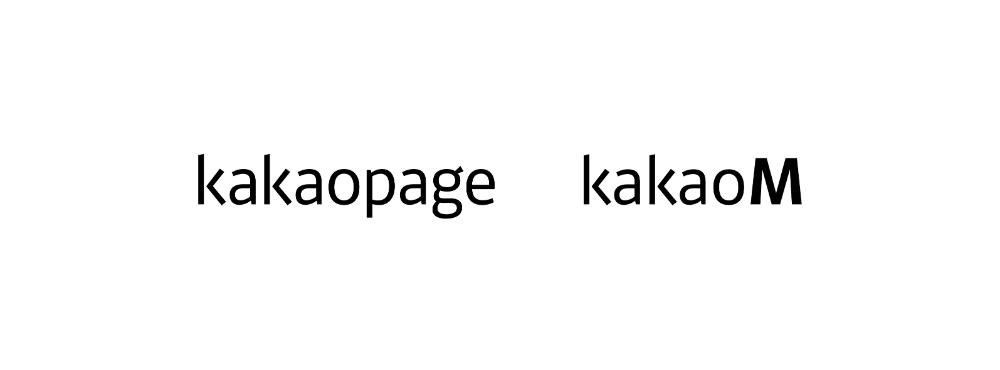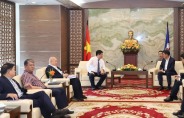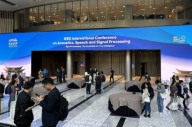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은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간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1주당 가액을 표기하는 합병비율은 양사의 기업가치와 발행주수를 반영한 것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기업가치는 1:0.6으로 책정됐다.
각 매출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카카오 자회사간의 대규모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결합하면 연매출 1조 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초유의 이번 합병은, IT, 유통 대기업들이 콘텐츠 신흥 강자로 도전장을 내미는 등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원천 스토리 IP 밸류체인’과 ‘글로벌 스토리 IP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한 카카오페이지와 음악, 드라마, 영화, 디지털, 공연 등 ‘콘텐츠 사업의 밸류체인’을 만들어왔던 카카오M이 결합이다. 이로써 새로운 합병법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
양사 합병으로 인해 연결되는 자회사와 관계사만 50여 개에 달한다. 엔터·콘텐츠 산업내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물론, 원천 스토리 IP 확보를 위한 CP(Contents Provider)부터 가수와 배우 등 아티스트, 음악·드라마·영화·공연의 기획·제작사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와 전 장르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지속 추진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합병법인은 양사가 축적한 IP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쳐 콘텐츠 IP의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슈퍼 IP의 기획·제작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M 김성수 대표와 카카오페이지 이진수 대표의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 콘텐츠 비즈니스 구조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이끌어 온 김성수 대표와, 대한민국에 없던 웹툰·웹소설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선도해온 이진수 대표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병 법인을 이끌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진화와 혁신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초경쟁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며 “양사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 그리고 밸류체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카카오M은 “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