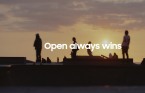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인수 예비입찰에는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SK텔레콤,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 본격적인 인수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미국 상장으로 인한 커머스 사업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데다, CJ그룹과 동맹을 맺은 네이버가 이번엔 유통 강자인 신세계와 협력에 나서면서 카카오를 자극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커머스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져있는 카카오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최근 카카오가 ‘쇼핑’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메뉴에 전면화시킨 것을 두고 카카오의 국내 커머스 시장 공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등 연장 선상에서 ‘인수 참여’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카카오의 이베이코리아 예비입찰 불참이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인수시 파급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인수 가격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단순 오픈마켓이 카카오 쇼핑과 중복된 사업인 데다 카카오의 관계형 서비스와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또 카카오가 거래액 산정 방식도 불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네이버를 거쳐 해당 사이트 통한 상품 구매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네이버와 이베이코리아에 동시에 정산돼, 카카오를 통한 구매 증가는 결국 네이버의 수익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경쟁 관계를 감안하면 카카오로서 이베이코리아 인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카카오와 SK텔레콤과의 관계다.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은 미국 아마존과의 본격적인 협업에 앞서 이번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11번가를 네이버·쿠팡과 나란히 ‘빅3’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의 인수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베이코리아 예상 매각 규모가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인수 가격 상승까지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인수 경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K텔레콤의 협상력은 더욱 떨어진다. 이미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등 굵직한 유통 기업이 뛰어든 상황에서 카카오까지 합류한다면 SK텔레콤으로선 큰 부담이다.
특히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을 서로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자제와 AI, 플랫폼, 미디어 등 미래사업 분야의 공동 지식재산권(IP) 풀(Pool)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양사간 밀접한 협력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와 SK텔레콤 양사간 연대를 높이는 시점에서 이베이코리아를 놓고 ‘경쟁관계’로 부딪치는 모습은 양사 모두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효과가 분명치 않은 만큼 카카오가 양보하는 모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M&A)는 인수 기업과 피인수기업간 철저한 손익계산에서 이뤄진다”면서 “카카오의 쇼핑과 이베이코리아간 인수 시너지가 확대보다는 반감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현장] AI컴퓨팅 전력소비 줄이기에 '사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1917582903842edf69f862c1182354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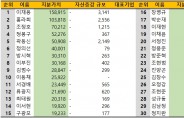












![[유럽 증시] 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유럽 3개국 지수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720184501291a6e8311f64218147901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