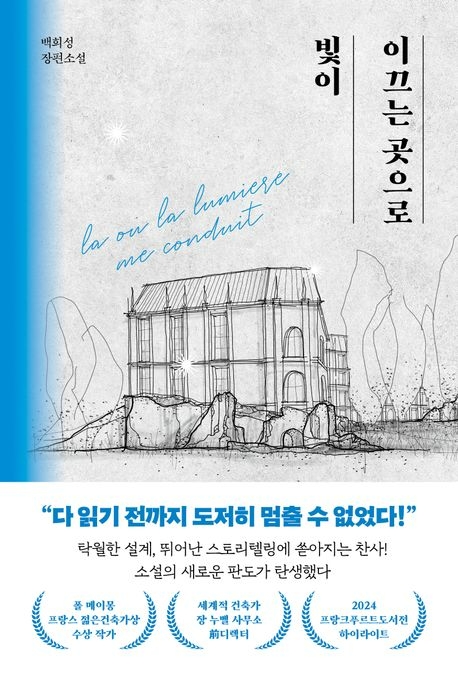빛이 이끄는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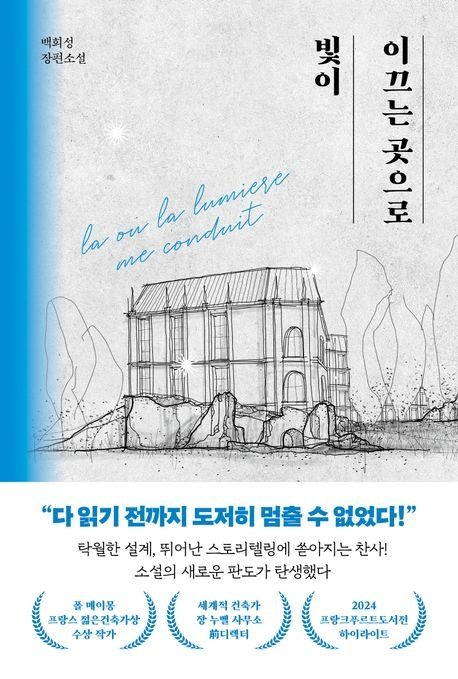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기억, 공간, 추억, 건축… 책의 사전 정보로 키워드를 나름대로 조합해 봤을 때 건축과 연결된 사랑 이야기가 이 소설의 큰 맥락 아닐까 추측했다. 하지만 스토리에 대한 진짜 키워드는 제목에 있었다. 바로 ‘빛’이다.
주인공인 ‘뤼미에르’는 프랑스의 건축가다. 언제나 남을 위한 건축을 해오던 그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건축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그래서 부동산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의 허름한 집을 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파리 시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건 어림도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뜻밖의 전화가 왔다.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에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의 집이 뤼미에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집은 최소 100년은 넘어 보였다. 하지만 공간 안에 들어서자,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집주인인 피터 왈처는 이 오래된 집을 이해하고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계약을 위해선 스위스 한 요양병원에 있는 집주인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피터를 바로 만날 순 없었다. 대신 피터가 미리 준비해둔 질문을 받아 들게 된다. “왜 4월 15일인가? 그리고 왜 당신이어야 하는가?”
피터는 건축가였던 아버지 프랑스와 왈처가 유산으로 남긴 저택과 이 요양병원에 대한 비밀을 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건축을 잘 아는 이가 필요했던 것 이다. 뤼미에르는 먼저 혼자 병원 구석구석을 살펴본다. 마침, 오늘은 4월 15일. 1년에 한 번 빛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라고 했다. 이상하리만큼 어둠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펼쳐진 화려한 빛의 향연에 그는 압도당한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긴 뤼미에르는 프랑스와가 남긴 두 건축물의 수수께끼를 하나둘 파헤치기 시작한다. 집에 남겨진 난간의 길이가 다른 계단, 울퉁불퉁하고 얇은 벽, 벽에 난 두 줄의 홈 등 읽는 내내 궁금증을 유발했던 이 수수께끼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아버지 프랑스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애틋함이 비밀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빛’을 활용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서사가 신선하고 놀랍기만 했다. 건축가로서 작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며 스토리에 한층 묵직한 감동을 더했다. 단숨에 머릿속은 파리의 그 공간으로 꽉 찬다.
이 문장처럼 공간에는 우리의 기억이 서려 있다. 그리고 일상이 켜켜이 쌓인 그 공간은 인생의 한 챕터로 남는다. 공간을 통해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누군가는 나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일상에 지쳐 있는 누군가를 따뜻한 기억이 깃든 그 공간으로 데려다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김다영 교보문고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