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랑타령’이나 하는 ‘사랑이 서툰’ 철부지 선생의 아이들. 때로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고민할 때도 있지만,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그것이 전해질 것이라 믿는 조금 고리타분한 선생을 만날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일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저마다의 성격으로 자랐을 아이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 정현종 시인의 말마따나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오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데, 34명의 각기 다른 일생을 마주한다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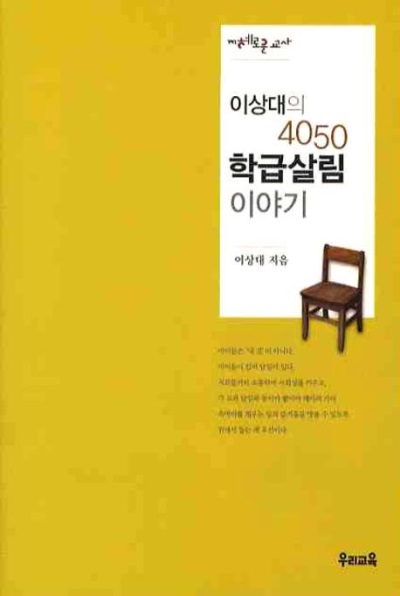
교사를 꿈꾸던 시절, 몇 번의 면접을 보며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참 많이도 받았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겠냐?’는 질문도. 교단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간절한 꿈으로 글썽이던 그때의 나는, 그 질문에 ‘사랑으로 지도하겠다.’는 이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곤 했었다. 뻔한 말을 너무나 진지하게 하는 내게,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순수한 건지 뭔지 갸우뚱하는 분도 계셨다. 몇 번의 좌절을 겪은 후 구체적인 방안을 답안으로 제시해야 함을 깨달았지만, 사실 나의 답은 ‘사랑’ 그것 뿐이었다. 그게 정말이었다. 그거면 필요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들으며 경험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그냥 그저, 느껴졌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이었지만, 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보다 참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매일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관심과 사랑으로서 ‘사람’을 세워 나갈 수 있으니, 그 사랑으로 세워진, 그 ‘사람’ 하나가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은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비효과.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다. 실제로 좋은 기억으로는 남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아무튼 그런 대단한 꿈을 꾸는 것 치고는 참으로 대책 없기도 했지만, 현재 나는 정말 꿈처럼 그렇게 교사가 되어있다.
교사가 되고 나서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은사님들을 찾아뵙거나 우연히 라도 뵙게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마음 깊이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부터 들곤 한다.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거나 학창시절 선생님과 함께 나눈 추억을 떠올릴 때면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게 된다. 방전된 배터리가 채워지듯 덕분에 사랑을 채우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겸허한 자세를 되찾게 되면 혼자 있을 때 읽고 또 읽는 책이 바로 이상대 선생님의 ‘4050 학급 살림 이야기’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마치 월령체 시가를 읊어내듯 학교의 풍속과 구성원의 삶을 노래하는 교사의 속 깊은 이야기. 이에 비하니 나의 사랑이, 나의 계획이, 문득 머쓱해진다. 말만 앞섰지 사실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처럼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이다. 매달, 어쩌면 이렇게 살뜰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셨는지 나는 도통 할 말이 없어진다. 첫 담임시절부터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나를 성장시켜준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야무지게, 지치지 않고 수위를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적응력과 자존감을 갖게 될까. 때로는 마냥 사랑을 표현하는 것 보다 짐짓 냉정한 척을 해야 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연기력이 부족해서 속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다. 혹시나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담임이 헤매면 아이들까지 덩달아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말에 바짝 정신을 차리자 다짐을 해본다.
열정을 쏟아내는 일도, 정신없이 바쁜 것도 감수해야할 내 몫이지만, 바쁘고 다급할수록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수시로 자문하여 중심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책에서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는 구절을 본 적이 있다. 조금 위안이 되는 말이다.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욕심을 비우고, 반드시 잘 해내야겠다는 부담도 내려놓자. 신이 아닌 이상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리라. 그저 아이들과 희희낙락 웃으며 즐겁게, 알뜰살뜰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스승들이 불현듯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의 추억 속에 살아있는 그 살뜰한 ‘마음’을 누긋누긋이 꺼내어보자. 교사가 되어보니 이제야 비로소 고마운 스승님들의 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다. 마냥 동경할 뿐이지, 철부지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노고. 일상에 젖어 살다보면 알면서도, 생각이 나도, 선뜻 연락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한 번쯤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보는 거다. 쑥스럽지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사실 가장 충전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학창시절 좋은 추억만을 남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본다.
한소진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아침독서편지 연구위원(덕신고등학교 교사)





























![[모바일 랭킹] 원신·니케, 신규 캐릭터 힘입어 매출 톱10 '역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2713583502668c5fa75ef86122545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