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카드사 지난해 순이익 2조962억원…전년 比 30.6% ↑
수수료 인하·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수수료 인하·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계는 2조962억원으로 전년(1조6047억원) 대비 30.6% 늘었다. 각사별로는 신한카드가 전년(6065억원) 대비 11.3% 증가한 675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영업수익은 4조3754억원으로 전년(4조1002억원)에 비해 6.7% 성장했다. 이중 리스 수익은 전년 대비 36.4% 증가해 3993억원을 기록했으며 할부금융은 7.6% 증가한 1587억원을 달성했다. 신용카드 수익은 0.5% 성장한 2조8623억원이다.
신용카드 취급액은 200조8000억원으로 정부 재정 확대와 민간 소비 증가, 온라인 결제 시장 성장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취급고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 인터넷쇼핑, 자동차, 주유 등에서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는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상품 체계를 재정립해 ‘iD카드’를 신규 출시, 고객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고객 기반과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4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247억원) 대비 29.0% 증가한 수치다. KB국민카드는 카드론과 할부금융 중심으로 이자이익이 늘었고 신용손실 충당금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카드는 결제성 수수료 증대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용 효율화 등으로 전년(1545억원) 대비 62.2% 증가한 25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올해 이 같은 호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 지난 달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됐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로 종전 0.8~1.6%에서 0.5~1.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또 올해부터 카드론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돼 대출 영업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차주별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시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든다.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도 카드사에 악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도 오르기 때문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오히려 역마진이다.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며 “카드론 수요 증가에 따라 대출을 확대해 이를 만회해왔으나 가계 부채 관리 강화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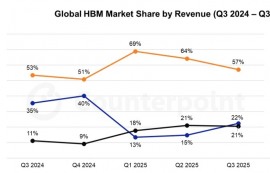







![[환율 안정책] 정부·한은, 외화건전성부담금 6개월 면제…외화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1715320205560bbed569d681281348011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