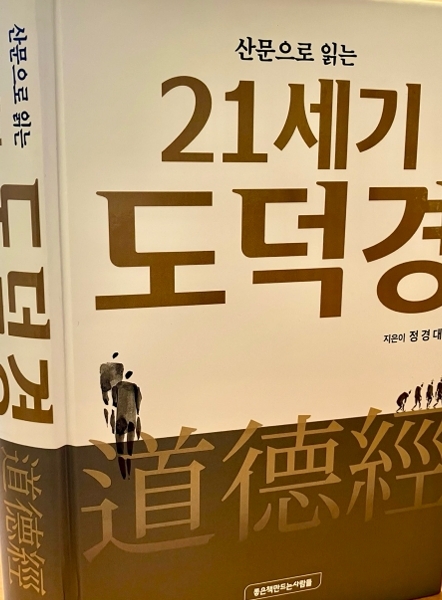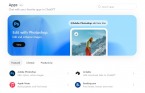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22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뒤이어 또 말하기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밝아지고,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으므로 드러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공이 있고, 자신의 재능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공이 오래 지속된다. 이에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지 않는다"라면서 "옛말에 휘어진 것은 온전해진다고 한 것을 어찌 빈말이라 하겠는가? 진실로 온전하게 되돌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만 가지 이치가 그렇다. 바르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르게 되돌려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진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에서 부족한 것을 채움에 있어 많으면 미혹된다고 함으로써 탐욕을 경계했다. 탐욕은 인간 자신의 영혼까지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부도덕성을 드러낸다. 특히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은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린다.
탐욕의 그릇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서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악업(惡業)을 쌓는 것도 없을 것이다. 세상살이에 욕심을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익의 대상인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욕심은 오히려 자신을 진화시키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평화를 가져다준다.
도로부터 분화된 삼위일체는 만물을 낳고 길러줌에도 그 공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공덕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공덕은 영원하다. 성인 역시 천하를 무위로 위할 뿐 공덕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그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늘 푸른 숲이 좋은 공기와 물과 재목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무위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은 없는 공덕도 교묘하게 지어서라도 자랑하며 세상에 자신을 널리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하여 명성을 얻어 타인 위에 군림하려 든다.
그러나 잘 뻗은 나무는 목수의 도끼에 급히 베이고, 꽃은 아름다울수록 쉬이 꺾인다. 말 없는 가운데 묵묵히 제 일에 열중하면 마치 깊은 산 숲속에 몸을 숨긴 백합이 그 은은한 향기를 내뿜어 숲을 장식하듯 저절로 그 덕이 천하에 두루 퍼져나가 세상을 평화롭게 해준다. 평화는 이웃에 덕을 베풀 뿐 다투지 않을 때 꽃향기처럼 퍼져나간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기적 속성은 시기·질투·원한을 사고 원한은 다툼을 유발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정이 멀어지면 비정한 먹이사슬계의 생사를 가르는 다툼처럼 인간 세상은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도가 그러하듯 마땅히 무위에 처해야 하거니와 이 말을 어찌 허언이라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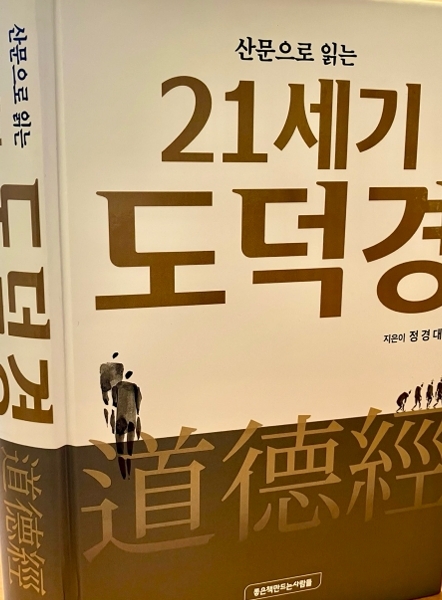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