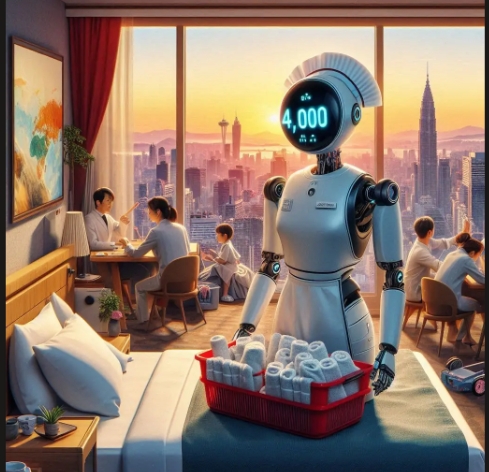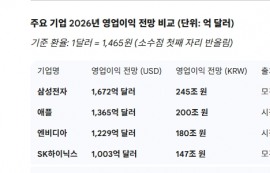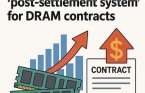접객업 22억달러 시장 성장세·구조로봇 72시간 생존율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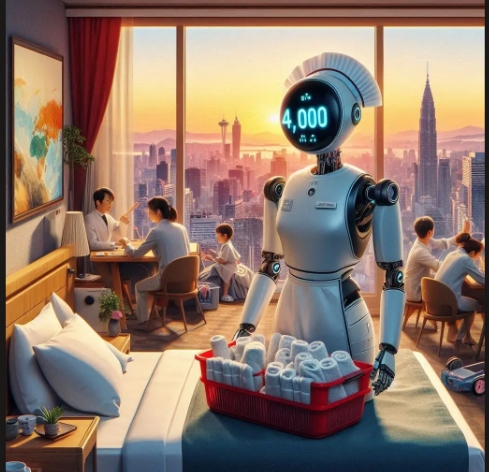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접객업·구조 분야 로봇 기술 현실과 한계
지난 6일(현지시각) 호텔 테크놀로지 뉴스에 따르면, 호텔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줬다. 일본 도쿄의 헨나(Henn-na) 호텔은 2015년 나가사키에서 개관한 뒤 전 세계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했지만, 기술 결함과 고객 불만으로 2019년까지 원래 240대의 안드로이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폐기했다.
부티크 호텔리어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행자의 61%가 서비스 로봇에 호의적 반응을 보인 반면, 29%는 로봇에 다가가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다. 실물과 같은 기계가 기쁨보다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접객업 로봇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 지난해 약 5억6700만 달러(약 7720억 원)으로 평가된 세계 시장은 2030년까지 22억 달러(약 2조9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1.5%에 가깝다.
지난 6일 모던 디플로머시 보도에 따르면, 재난구조 분야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 진행한 커서(CURSOR)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스머프(SMURF·Soft Miniaturised Underground Robotic Finder)는 붕괴된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는 소형 구조로봇이다.
지진이나 폭발이 있은 후 72시간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2016년 8월 24일 강력한 지진이 이탈리아 중부를 강타해 299명이 사망했을 때, 5000명 이상의 응급 구조대원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나서 그 직후 잔해에서 수십 명을 구조했다.
독일 연방 기술 구호국의 연구 코디네이터 티나 리스트매(Tiina Ristmäe)는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 최초 대응자를 지원하는 기술이 많지 않으며, 보유한 기술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토타입 기술"이라고 말했다.
스머프에는 스니퍼(SNIFFER)라는 화학센서가 들어있어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같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내뿜는 물질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도 구별할 수 있다.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 연기나 비 같은 경쟁적 자극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입증됐다.
연구진은 스머프의 도달 범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드론 지원도 시스템에 통합했다. 맞춤형 드론은 로봇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로봇을 직접 배송하는 데 사용된다. 도호쿠 대학의 로봇 전문가 사토시 타도코로(Satoshi Tadokoro) 교수는 "여러 대의 로봇이 전체 잔해 더미를 덮으며 희생자를 찾기 위해 잔해 깊숙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 2030년대 가정용 로봇 혁명 전망
저명한 벤처캐피털리스트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 앞으로 2-3년 내에 로봇공학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챗GPT(ChatGPT)가 가져온 것과 같은 혁신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슬라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로봇공학의 중추적 돌파구가 나타날 것이며, 2030년대까지 월 300-400달러(약 40-54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적응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톱뉴스는 지난 7일 보도했다.
그는 차세대 가정용 로봇이 주로 음식 준비와 식기 세척 같은 주방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며, "역동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유연성을 반영해 새로운 환경에 직관적으로 적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메리어트와 힐튼은 릴레이(Relay)와 새비오케(Savioke) 로봇을 사용해 객실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알로프트(Aloft)와 IHG 호텔은 IBM 왓슨으로 구동되는 코니(Connie) 같은 컨시어지 봇을 배치하고 있다. 한국의 고급 호텔에는 목욕을 돕거나 객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로봇 버틀러가 있고, 중국에서는 호텔 로봇이 룸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 투숙객을 위해 실시간 번역 방송을 한다.
UC 버클리의 로봇공학자 켄 골드버그(Ken Goldberg)는 "로봇이 로봇처럼 보이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다"며 "접객 서비스에서는 봇을 사용해 수하물을 들어 올리거나 객실을 소독하는 동시에 감성 지능을 인간 직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로봇 기술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술은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고, 공감과 문제 해결은 인간의 영역에 남겨두는 방식이다.
리스트매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프로토타입 구조 키트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서 수백 건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