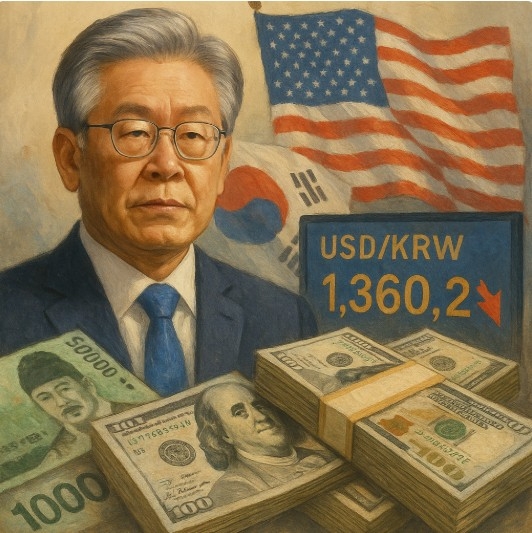코스피 사상 최고·외국인 순매수에도 원화 '뒷걸음'…투자 합의 불확실성 부각
연간 960억 달러 '환전 폭탄' 우려…정부, 통화스와프 필요성 제기하며 시장 불안 가중
연간 960억 달러 '환전 폭탄' 우려…정부, 통화스와프 필요성 제기하며 시장 불안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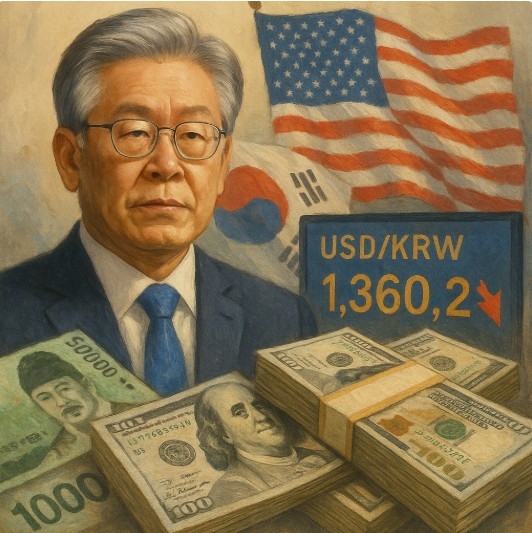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외국인 자금의 거센 유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라는 좋은 조건에도 원화 가치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무역 분쟁 완화와 시장 개방을 기대했지만 지난 8월 26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장의 시선이 통상 문제를 넘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향하는 이유다.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과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 원화 약세의 핵심 원인으로 대미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을 짚었다.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80억 달러(약 11조 원)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는데도 원화 가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하반기 들어 원화는 아시아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6월 말에 비해 3%나 떨어졌다.
소시에테 제네랄 성기용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9월의 상당한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을 생각하면 달러당 원화 환율은 1360원 아래로 더 내렸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 가지 잠재적인 상쇄 요인은 한국이 계획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대미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라고 밝혔다. 시장의 긍정적인 힘들이 거대한 잠재 달러 수요 앞에서 기를 펴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장 우려, 정부로 확산…'통화스와프' 카드 만지작
이러한 우려는 정부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이행 과정에서 생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투자 합의가 환율 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투자금이 앞으로 3년에 걸쳐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것이 원화의 구조적인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외화를 빼더라도, 실제 필요한 달러 환전 수요는 한 해 960억 달러(약 13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한 해 해외투자 달러 수요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분석했다.
연말 환율 전망 '동상이몽'…강세론 속 신중론
물론 시장 전망이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원화 강세 요인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의 견조한 오름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과 탄탄한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가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말 원화 환율을 달러당 1340원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금 유출이 계속될 수 있지만, 9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와 강력한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 4분기 양호한 경상수지가 원화를 더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연말 환율 전망치는 평균 1370원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전망보다는 다소 보수적이다. 대미 투자라는 특별한 변수가 원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DB증권 문홍철 이코노미스트는 근본적인 한계를 짚었다. 그는 "수출에 기대는 한국 경제는 무역 분쟁과 관세에 약하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흐름조차 원화의 뚜렷한 강세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원화 강세의 발목을 잡는 한계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미 투자 합의는 환율과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한국 경제는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과 달러 수급 압박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