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GE·미쓰비시 3사 독점에 2030년까지 물량 동났다...개도국 석탄 의존 장기화·선진국 전력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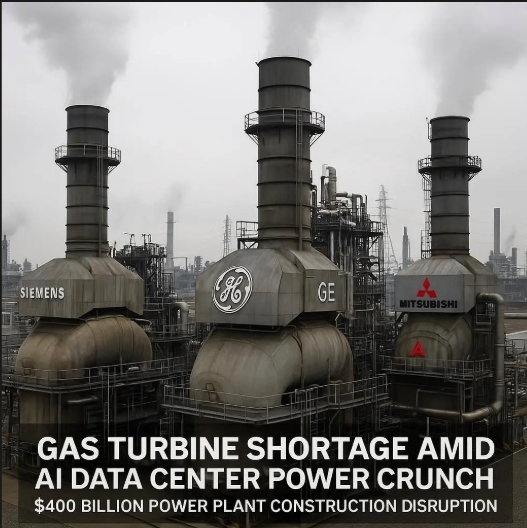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각) 가스터빈 시장을 장악한 3개 기업의 생산능력이 폭발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전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3대 기업 과점 체제, 생산능력 한계 직면
가스터빈 시장은 독일 지멘스 에너지, 미국 GE 베르노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3개 기업이 전체 생산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다. 이들은 독일 베를린부터 일본까지 소수 공장에서 해마다 수십 대의 대형 터빈만을 생산한다.
지멘스 에너지의 베를린 공장에서는 500톤에 이르는 가스터빈 1대를 완성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 분당 3000회전을 견뎌야 하는 터빈 축을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금속을 연마하고 수백 개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터빈은 한 해 약 50대에 그친다.
요른 슈뮤커 지멘스 에너지 수석부사장은 "생산력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며 "공급망 전체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GE 베르노바는 이미 2030년까지 터빈 주문을 놓고 고객들과 협상 중이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2027년과 2028년 대부분의 생산 일정이 예약된 상태다.
AI 혁명이 촉발한 전력 수요 '슈퍼사이클'
전력 수요 폭증의 주범은 AI다. 블룸버그NEF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5년까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렌조 시모넬리 베이커휴스 최고경영자는 "AI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가스터빈 수요를 급증시켰다"고 분석했다. GE 베르노바의 터빈 예약 물량 중 약 3분의 1이 AI 및 대형 기술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정체된 전력 소비가 반등해 2030년까지 25% 늘어날 것으로 컨설팅 업체 ICF가 내다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조사에서 발전사업자들은 2028년까지 26기가와트(GW) 이상의 가스발전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3년 당시 앞으로 3년간 계획량의 2배에 이른다.
존 케첨 넥스트에라 에너지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투자자 설명회에서 "가스터빈 부족과 높은 수요 때문에 가스발전소 건설비용이 급등했다"며 "2021년 킬로와트(kW)당 800달러(약 112만 원)였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이 현재 2600~2800달러(약 360만~39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대 전력생산업체 중 하나인 NRG 에너지는 GE 베르노바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5.4GW의 가스발전소를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NRG 경영진은 계약 발표에서 AI가 전력 '수요 슈퍼사이클'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등 개도국, 석탄발전 의존 장기화 우려
가스터빈 부족 사태는 개도국에 더 큰 타격을 준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발전용량을 2배로 늘리려는 목표 아래 롱안 발전소를 포함해 최소 22개 가스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용량을 5배 확대해 석탄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블룸버그 조사 결과 현재까지 구속력 있는 터빈 계약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단 1건에 그쳤다. 호치민시에서 27km 떨어진 롱안 발전소 프로젝트를 소유한 비나캐피탈 대변인은 "터빈 공급업체 선정 과정이 최종 단계에 있으나 아직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공급업체들이 생산 일정 확보를 위해 환불 불가능한 선금을 요구하고 있어 예전의 조달 관행과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쿠옹 트란 득 CMIT 전무이사는 "전 세계 가스터빈 부족 사태는 심각하고도 간과되기 쉬운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다니엘 발데크 HSF 크레이머 파트너 변호사는 "가스터빈은 제조와 납품에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지연의 영향이 아시아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적체가 계속되면 개발업자들이 석탄발전을 선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최대 20개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일본 전력회사들도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를 고려해 신규 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수십 억 달러를 투입해 가스발전소를 급속히 늘리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시장 독점 강화, 3사 주가 급등세
1990년대 미국 전력시장 규제 완화로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후 가스 가격 상승으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업계 통폐합이 진행되었고 현재의 3사 체제가 굳어졌다. 수십 년간 부진한 판매 실적 때문에 이들 기업은 생산능력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GE 베르노바는 지난해 2026년부터 한 해 대형 가스터빈 생산능력을 기존 55대에서 70~80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뉴욕 등지의 터빈 생산 확대를 위해 약 3억 달러(약 42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에이사쿠 이토 미쓰비시 중공업 최고경영자는 "생산력을 30% 늘리려고 했으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2년 안에 가스터빈 생산력을 긴급히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카이저 지멘스 에너지 회장은 지난 7월 "지멘스 에너지는 이제 AI 관련주"라며 "우리 제품이 AI 산업에 필수이기 때문에 AI 투자펀드를 설계할 때 항상 지멘스 에너지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슈뮤커 수석부사장은 "우리 업계의 장점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사의 주식은 급등세를 보인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이들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해 10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선보인 자체 개발 터빈의 출력은 300메가와트(MW)로, 3대 공급업체의 대형 모델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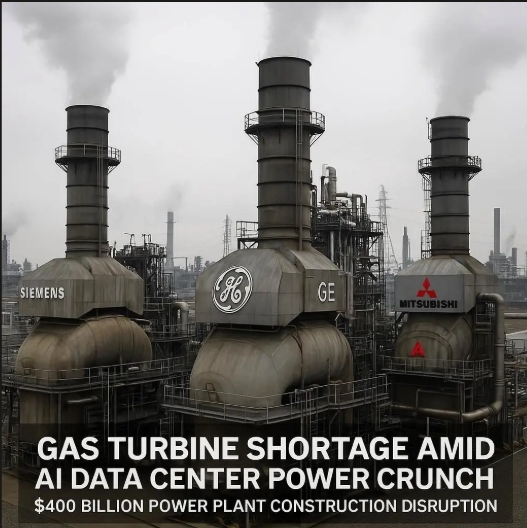



![[뉴욕증시] MS·메타 악재에 3대 지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03106461204539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