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 도핑 및 MBE 공정으로 '저항 제로' 구현, 양자컴퓨터 대량 생산 청신호
실리콘 이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혁명 예고….TSMC 등 AI 칩 제조사 영향 주목
실리콘 이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혁명 예고….TSMC 등 AI 칩 제조사 영향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미국 뉴욕대학교, 스위스 ETH 취리히,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공동 연구진은 갈륨(Gallium)이 초도핑(hyperdoped)된 게르마늄(Germanium) 박막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치환형 갈륨 초도핑 게르마늄 에피택시 박막에서의 초전도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극저온의 벽' 넘어, 반도체 공정으로 초전도 대중화 물꼬 트다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없어 열 손실 없이 강력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혁신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현재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ERN)의 입자 가속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기부상열차 등 극히 까다로운 응용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전도성을 발현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절대 영도보다 겨우 몇 도 높은 극저온이나, 초고압, 또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은 대규모 응용 분야에서 초전도 물질의 사용을 비경제적이고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이미 전자 및 광학 장치 생산에 널리 사용되며 공정이 잘 이해되고 있는 게르마늄 기반 반도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르마늄은 실리콘과 함께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진 14족 원소로서, 반도체 생산의 핵심 물질이다.
뉴욕대학교 양자 정보 물리학 센터의 자바드 샤바니(Javad Shabani) 소장은 이 발견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4족 원소들은 자연적으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결정 구조를 변형하면 초전도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쌍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 연구진은 도핑된 게르마늄 격자 내에서 갈륨이 전자를 짝지어(쿠퍼쌍, Cooper pairs) 저항이 없는 흐름을 형성하며 초전도성을 구현함을 확인했다. 특히, 결정 내 왜곡(테트라고날 왜곡)이 전자 이동의 양자 통로를 생성하는 물리적 현상이 초전도화의 핵심 돌파구로 작용했다.
웨이퍼 규모 초전도 소자 생산 시대 개막
종전에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같은 반도체에서 초전도 거동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갈륨 도핑 수준이 높아지면 원자 구조가 불안정해져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등 대규모 생산에 난항을 겪어왔다.
연구진은 기존의 이온 주입 방식 대신 분자선 에피택시(MBE: molecular beam epitaxy)라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MBE는 초고진공 환경에서 원자 또는 분자 빔을 가열된 기판 위로 정밀하게 주사하여 박막을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퀸즐랜드대학교의 피터 제이콥슨(Peter Jacobson) 연구원은 이에 대해 "게르마늄은 이미 첨단 반도체 기술의 핵심 소재이므로, 통제된 성장 조건 하에서 초전도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확장 가능한 파운드리 사용 가능 양자 장치에 대한 잠재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퀸즐랜드대학교의 줄리안 스틸(Julian Steele) 연구원 역시 MBE의 정밀도를 높이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온 주입 대신 분자선 에피택시(MBE)를 사용하여 갈륨 원자를 게르마늄의 결정 격자에 정밀하게 통합했습니다. 얇은 결정층을 성장시키는 에피택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침내 이러한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 갈륨 도펀트가 게르마늄 격자 내에 치환되면서 정방정계 왜곡(tetragonal distortion)이 유도되고, 이 구조적 질서가 초전도 현상을 위한 좁은 전자 띠를 생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이 확인됐다.
퀸즐랜드대학교의 칼라 베르디(Carla Verdi) 연구원는 이론적 해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론적 작업은 갈륨 원자가 게르마늄 격자 내에 깔끔하게 치환되어 초전도 현상을 위한 전자적 조건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계산과 실험이 함께 반세기 이상 재료 과학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아한 예입니다."
더욱이 이 MBE 기반 도핑 방법은 전자 칩을 대량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웨이퍼 수준 규모(wafer-level scale)에서 작동할 수 있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써 대규모 전자칩 제조에 쓰이는 기존 게르마늄 기반 반도체 생산라인 및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
양자컴퓨터 및 극저온 전자장치 혁신의 열쇠
비록 이 기술이 개발자들이 염원하는 상온 초전도 현상은 아니며, 초전도 현상을 발현하기 위해 3.5°K(-269°C/-453°F)라는 낮은 임계 온도를 필요로 하지만,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잘 확립된 제조 기계를 통해 쉽게 생산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이로 인해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값비싼 기존 초전도 물질 대신, 칩의 특정 부분만 초전도 상태로 전환된 '일반적인' 갈륨-게르마늄 반도체 웨이퍼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기술은 초전도성과 반도체성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양자소자’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결정적 의의를 지닌다.
퀸즐랜드대학교의 피터 제이콥슨 연구원은 "이러한 물질들은 하이브리드 양자 장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으며, 미래의 양자 회로, 센서, 그리고 저전력 극저온 전자 장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초전도 영역과 반도체 영역 사이의 깨끗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합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기술은 반도체 집적 소자에 초전도성을 직접 구현 가능해져, 정보처리 단위 큐비트(qubit)나 초미세 양자센서(SQUID) 등 차세대 양자컴퓨터 및 센싱 소자 생산을 훨씬 용이하게 만든다. 저전력 극저온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초전도 회로와 반도체 소자의 인터페이스가 깨끗하게 구현되어 전력 소비와 신호 손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초전도 물질의 임계 온도는 산화구리 계열(YBCO)이 92 K, 고압 하 수소화물(H₃S)이 203 K에 달하지만, 대량 생산 확장성 측면에서는 취약하거나 극한의 압력 조건이 필요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갈륨 도핑 게르마늄은 임계 온도가 3.5 K로 낮지만, 웨이퍼 수준에서 구현 가능한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다.
반도체 산업의 거인인 TSMC는 현재 최첨단 3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실리콘 칩 생산을 선도하고 있지만, 첨단 게르마늄 기반 트랜지스터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발견은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제조용 첨단 칩 생산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TSMC를 비롯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산업표준 반도체 소재(게르마늄+갈륨)를 활용한 초전도 소자가 미래 웨어러블, 저전력 컴퓨팅, 차세대 IT 시스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실온·상압 초전도 달성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또한 고농도 도핑에 따른 장기적 안정성, 대면적 균일성, 상업적 대량 양산 체계 등이 추가 검증 대상임을 지적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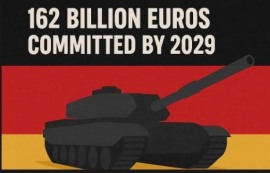


![[초점] 카타르에너지, 삼성물산과 410만 톤 CCS EPC 계약 체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0310262201944fbbec65dfb591524497.jpg)


![[특징주] SK하이닉스, '60만원' 코앞... 증권가 목표가 줄줄이 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031008410772744093b5d4e1121441241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