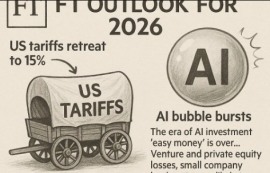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만약 귀신이 아니라 음식이 공포를 일으킨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말이다. 음식을 이용한 독살을 염려하던 고려·조선시대의 왕들은 아마 이런 공포를 잘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식의(食醫)를 두어 자신에게 올리는 음식을 조사, 감별, 통제하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음식 공포(fear of food)는 왕이 아니라 백성인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음식 공포는 개인적 음식 공포(individual fear of food)와 대중적 음식 공포(public fear of food)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타민족의 음식과 같이 특정음식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 공포, 즉 푸드 포비아(food phobia)가 있고, 후자에는 병원균이나 발암물질과 같이 음식에 들어있는 위해요소로 인해 일반인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대중적 공포가 있다. 두 가지 공포가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후자의 대중적 음식 공포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관련 사건·사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대중적 음식 공포가 문제가 되는 주된 요인은 그 파급력에 있다. 과학적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대중적 공포는 폭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관련 사건·사고는 아주 작은 것도 커질 수 있고, 안 일어나도 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공포의 크기가 원인의 무게에 비해 너무 크다면 사회적 손실은 뼈아프다.
물론 공포의 핵심은 위해성이 잠재되어 있는 단무지 자투리를 사용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공포를 일으킨 원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예방을 위해 관련업체들은 음식윤리의 소비자 최우선 원리를 제대로 지켰어야 했다. 이 원리는 '엄마의 된장', '아빠의 빵', '주인도 먹고 손님도 먹는 음식'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잠재적인 위해성조차 거론할 여지없는 '착하고 바른'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원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중적 음식 공포 문제는 음식윤리의 관점으로 풀어야 제대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뉴욕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2025년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10106433108114c35228d2f51751931501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