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익공유제의 핵심은 정부가 자금난으로 도산 우려에 있는 기업에 지원해 정상화한 뒤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 구성원 전체가 아닌 경영자를 비롯한 일부에게만 그 과실이 돌아갔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있었다.
정부는 이익공유제의 핵심 사항인 경영이 악화하더라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정부가 기업들에 자금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의지도 이익공유제 성공의 한 축이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중심으로 상생 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시혜적' 성격이 짙다. 이익공유제가 기업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상생인지 자문해야 한다. 우려는 정부·정치권·노동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작정 반대가 능사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지난 총선에서 목도한 대한민국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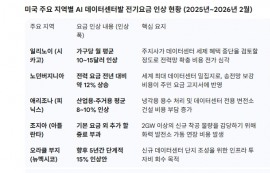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