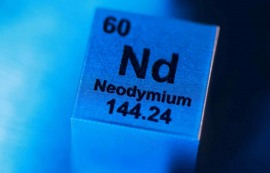큐비트 숫자 경쟁 지고 '시스템 통합' 시대로…엔비디아, SC25서 'NVQ링크' 공개
"독립 플랫폼 아닌 데이터센터 가속기로 재편"…2030년 산업 표준화 전망
"독립 플랫폼 아닌 데이터센터 가속기로 재편"…2030년 산업 표준화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엔비디아가 그리는 미래 컴퓨팅의 청사진이 명확해졌다. 핵심은 '홀로서기 포기'와 'AI와의 동거'다.
24일(현지시각) IT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양자 프로세서를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2027년을 양자컴퓨팅 상용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는 수십 년간 이론적 가능성에 머물러 있던 양자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인 데이터센터 심장부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AI·양자 혈관 잇는 'NVQ링크'
지난 11월, 전 세계 슈퍼컴퓨팅 기술의 향연장인 미국 세인트루이스 'SC25' 컨퍼런스. 예고 없이 무대에 등장한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묵직했다. 그는 양자컴퓨팅이 연구실(Lab) 단계를 넘어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단계로 진입하는 결정적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엔비디아가 꺼내 든 비장의 무기는 'NVQ링크'다. 복잡한 기술 명칭 같지만, 핵심은 '연결'이다. 그동안 양자컴퓨터는 고립된 섬처럼 존재했다. 하지만 NVQ링크는 양자 프로세서(QPU)를 엔비디아의 강력한 GPU 가속 컴퓨팅 스택과 직결시킨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슈퍼컴퓨터)가 막힘없이 대화하게 만드는 업계 최초의 '범용 인터커넥트'인 셈이다.
젠슨 황은 이 기술이 현재 수백 큐비트 수준인 양자 시스템을 향후 수만 큐비트 단위로 확장하는 '스케일링(Scaling)'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VQ링크는 현재 하드웨어가 가진 치명적 약점인 오류를 보정하고, 향후 10년간 직면할 연산 난제들을 해결할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이미 미국 주요 국립 연구소와 양자 하드웨어 기업 등 12개 이상의 글로벌 슈퍼컴퓨팅 센터가 이 시스템 도입을 확정 지었다.
"큐비트 숫자 싸움은 끝났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행보는 시장의 경쟁 문법이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헤더 웨스트(Heather West) 양자 시스템 리서치 매니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경쟁의 축이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양자컴퓨팅 업계는 '누가 더 많은 큐비트를 만드느냐'는 숫자 싸움에 매몰돼 있었다. 하지만 웨스트 매니저는 "다음 단계의 경쟁은 큐비트 카운트나 고립된 칩 설계가 아닌,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능력이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자컴퓨팅과 생성형 AI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기술을 얼마나 매끄럽게 융합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독립 플랫폼 아닌 '가속기'로
웨스트 매니저의 분석 중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양자 하드웨어의 위상 변화다. 그는 "양자 하드웨어는 결코 독립적인 플랫폼(Standalone platform)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신 오늘날의 GPU가 그러하듯,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특정 고난도 연산을 처리하는 '가속기(Accelerator)'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양자컴퓨팅의 상용화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 IDC가 제시한 워크플로우에 따르면, 미래의 사용자는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이후 리소스 관리 소프트웨어가 전체 작업 중 양자 연산이 필요한 부분만 발라내고, 이를 '회로 니팅(Circuit knitting)' 같은 기술로 정교하게 실행한 뒤 결과를 합쳐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이 복잡한 과정을 물 흐르듯 처리하기 위해 NVQ링크 같은 통합 솔루션이 필수불가결해지는 것이다.
현재 양자 플랫폼 시장은 △특정 수학 문제용 △조합 최적화용(어닐링) △범용 게이트 기반 등 3파전 양상이다. 이 중 가장 복잡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생태계 전략과 맞물려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2027년, 돈 버는 양자컴 온다
업계는 이 기술적 융합이 가져올 상업적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시점이 보인다는 뜻이다.
분석가들은 오는 2027년이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가 특정 산업 영역에서 정량적인 상업적 이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에는 기업 수요가 폭발하며 데이터센터의 핵심 확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2029년 생태계 안정화를 거쳐 2030년에는 글로벌 산업 표준이 확립될 전망이다.
결국 SC25에서 엔비디아가 던진 화두는 명확하다. 양자컴퓨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다.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데이터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2027년이라는 '상용화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뉴욕증시] 빅테크 강세 속 3대 지수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602232607989be84d876741182211201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