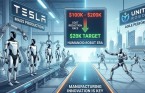미국 배터리 '현지화 전쟁' 격화...SK온 180GWh 생산기지 구축
중국 견제 바람에 한국기업 '특수'...21GWh 취소에도 미국 자국산 수요 급증
중국 견제 바람에 한국기업 '특수'...21GWh 취소에도 미국 자국산 수요 급증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FEOC 규제에 따르면 2026년부터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으려면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5%가 금지된 해외법인이 아닌 곳에서 마련돼야 하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7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 SK온, L&F와 업무협약으로 북미 LFP 공급망 구축
SK온은 지난달 국내 배터리 소재 선도기업인 L&F와 북미 시장용 LFP 양극재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공급 물량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중장기 동반자 관계를 만들 계획이다.
SK온은 현재 미국에서 2개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며, 동반자 회사들과 함께 4개 공장을 더 지을 예정이다. 모든 공장이 완전히 돌아가면 연간 생산능력이 180GWh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SK온 조달담당 신영기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은 SK온의 LFP 배터리 가치사슬 강화와 북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 진출에 중요한 표시"라며 "미국산 LFP 배터리의 강력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얼션테크놀로지스는 네바다주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시리즈 A 투자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유타주 기반의 토러스(Torus)가 투자를 주도했으며, 네바다주 경제개발청이 관리하는 벤처캐피털 프로그램인 배틀본벤처도 참여했다.
토러스는 얼션의 고객이기도 하다. 토러스 최고경영자(CEO) 네이트 워킹쇼는 투자에 대해 "투자자이자 고객으로서 해외 배터리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위험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얼션의 네바다 공장은 주로 국내 공급망에서 구해온 원료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으며, 곧 완전한 국내 조달을 이룰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투자로 국내 생산능력을 5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얼션은 캐나다 기반 퍼스트포스페이트(First Phosphate)를 위해 LFP 셀을 조립하기도 했다. 퍼스트포스페이트는 최근 "북미에서 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 상업급 LFP 18650 형태 배터리 셀을 생산했다.
◇ 얼티움셀스, 테네시 공장 LFP로 바꿔...2027년 상업생산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인 얼티움셀스는 테네시주 스프링힐 배터리셀 생산공장을 LFP 셀 생산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2021년 처음 발표된 23억 달러(약 3조1400억 원) 투자의 일환으로, 올해 말부터 배터리셀 생산라인을 바꾸기 시작해 2027년 말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스프링힐 공장은 원래 캐딜락 리릭(LYRIQ) 등 GM 차량용 니켈망간코발트(NMC) 배터리셀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려고 지었다. 회사 측은 이 시설이 다양한 셀 화학 성분의 빠른 통합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하이오주 워렌 공장은 계속해서 NMC 셀을 생산할 예정이다.
GM은 LFP 기술로 현재 고니켈 배터리팩에 견줘 상당한 비용 절약을 목표로 하면서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GM은 2022년 에너지저장과 에너지관리 솔루션 사업부인 GM에너지를 출범시켜 가정용과 상업·산업용 에너지저장 관리 솔루션인 얼티움홈과 얼티움커머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 미시간주 홀랜드에서 LFP 셀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원래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라인으로 지어졌지만, ESS 셀 대량생산에 집중하도록 다시 구성됐다.
◇ ESS 공장 취소에도 국산화 수요는 계속 늘어
그러나 미국 내 배터리 제조 확산에도 일부 프로젝트는 취소되고 있다.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EA)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에너지저장 공급·기술·정책·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28년 목표 에너지저장 셀 생산능력 21GWh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취소됐다.
취소된 프로젝트로는 코어파워(KORE Power)의 애리조나주 연 9.6GWh 공장과 프레이어(FREYR)의 조지아주 연 10.2GWh 공장이 있다.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의 연 1~5GWh 규모 프로젝트들도 정책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고 CEA는 밝혔다.
2028년 연간 수요가 100GWh 목표에 닿을 경우 21GWh 생산능력 손실이 업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CEA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CEA는 원장비제조업체(OEM)와 국내 통합업체 역량이 늘어나면서 현지 통합시스템이 미국에서 더욱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 ESS 선택은 15~20% 비용 웃값이 있지만, 중국산 콘텐츠가 줄어들어 "관세 위험을 가장 작게 하려면 비용이 더 높더라도 미국 내 제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근 중국 제조업체 한 곳이 텍사스에 10GWh 배터리 제조 공장을 연 것처럼, 더 많은 통합업체들이 비용이 낮은 국가에 제조 시설을 두는 대신 최종 시장과 제조 능력을 함께 두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미국 밖 지역을 찾을 경우, 최대 킬로와트시당 40달러(약 5만4000원)의 관세를 피하려면 한국과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셀과 시스템을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CEA는 제시했다.
중국 밖 LFP 셀 제조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2026년 초까지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선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최근 예산법안의 해외우려법인 규칙이 최저비용 공급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된 낮은 리튬 가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달러(약 1만3000원) 아래에서 10년 대부분 동안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당한 무역 장벽에 맞지 않는 나라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개발업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비리튬 배터리 기술과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은 모두 험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