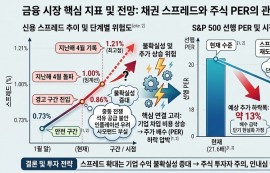2033년 국산 ‘바랏 SMR’ 가동... 민간 개방으로 ‘에너지 자립’ 가속
러·중 독주 SMR 시장 지각변동... 韓 공급망 진입 ‘기회와 위기’ 공존
러·중 독주 SMR 시장 지각변동... 韓 공급망 진입 ‘기회와 위기’ 공존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영국 과학 전문 매체 피직스 월드(Physics World)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인도가 원자력 발전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2000억 루피(약 3조 2500억 원)를 투자해 독자 기술로 설계한 SMR 상용화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70년 만의 민간 개방... ‘바랏 SMR’로 기술 독립 선언
인도 의회는 지난달 원자력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1962년 원자력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빗장을 푼 것이다.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발전 용량을 500기가와트(GW)로 늘리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 미션을 가동해 2033년까지 자체 기술로 설계한 SMR 5기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핵심 모델은 가압경수로(PWR) 기술을 기반으로 한 200메가와트(MW)급 ‘바랏(Bharat) 소형모듈원자로’다. 인도 원자력부(DAE)는 이와 별도로 55MW급 초소형 모델 개발과 민간 협력을 통한 220MW급 원자로 보급도 병행한다.
SMR은 대형 원전과 달리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부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한다.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자본 부담이 덜해 송전망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은 1996년 17.5%에서 최근 9%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인도는 SMR을 통해 이 흐름을 뒤집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러시아·중국 추격... 산업단지 ‘자가 발전’ 대안 부상
현재 세계 SMR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앞서 있다. 러시아는 해상 부유식 SMR을 가동 중이며, 중국은 고온가스냉각 방식의 SMR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 등 서방 기업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도의 가세는 ‘3강 구도’ 혹은 다극화 체제로 시장 판도를 바꿀 변수다.
카르틱 가네산 인도 에너지·환경·물위원회(CEEW) 이사는 "SMR은 대규모 투자가 힘든 산업단지의 자가 전력원으로 훌륭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넓은 국토에 분산된 산업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SMR이 최적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성·핵폐기물 난제... "재생에너지보다 비쌀 것" 경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 원전보다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는 해결해야한다.
엠브이(M.V.) 라마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원자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메가와트당 발전 단가가 올라간다"라며 "SMR이 생산하는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투자비는 적지만, 생산 단가는 결코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논란거리다. 라마나 교수는 "우라늄 채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수십만 년간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입증된 방법은 아직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네산 이사는 "기술 발전으로 연소율을 높이면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원자력은 여전히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라고 반박했다.
韓 원전 업계, 공급망 진입 기회... 장기적으론 ‘경쟁자’
인도의 원전시장 개방은 한국 기업에 기회이자 위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한국 원전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기기 제조 역량을 보유했다. 인도가 추진하는 ‘바랏 SMR’ 사업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거나 현지 기업과 짝을 이뤄 진출할 길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인도가 자체 모델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SMR(i-SMR)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인도와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3국 수출 시장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원전 업계가 단순한 기자재 공급을 넘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