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선박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어"
중국 해군 370척 보유했지만 미국은 296척에 불과
낙후된 시설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은 아직 걸림돌
중국 해군 370척 보유했지만 미국은 296척에 불과
낙후된 시설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은 아직 걸림돌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 대통령은 김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둘러보며 벅찬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韓 필요한 미국 조선업
한·미 조선 동맹이 첫발을 내디뎠다. 그 배경에는 쇠퇴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조선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선소 8곳과 민간 조선소 64곳 등 70여 곳 조선소에서 연 1000척 정도 선박을 만들었던 과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은 올해 395척, 2030년에는 435척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해군은 올해 1월 기준 296척만 운용하고 있다.
미 조선업은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상선 건조에서도 너무 뒤처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세계 민간 선박 건조량의 0.1%를 차지했다. 중국의 점유율이 53.3%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9.1%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함정·상선 시장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낙후된 시설과 규제는 여전히 어려움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 미국의 현지 생산 여건이 열악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더라도 당장 경쟁력 있는 선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다. 노후 시설 보수에는 숙련공이 필수인데, 한국의 우수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경우 국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법적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사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소유·운항되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이들 법을 개정·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서로 윈윈하려면 미국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조선산업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가(船價)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지 생산이 유리하다”면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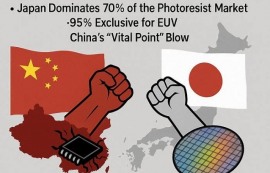




![[뉴욕증시] 4분기 실적·12월 CPI 발표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11106515507104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