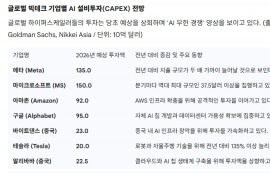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물론 외식비가 줄어드는 만큼 가정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집밥을 위해 누군가는 음식 준비를 더 자주 해야 한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반갑지 않은 또 다른 아이러니다. 역으로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 외식이 폭증하고 집밥이 대폭 감소할까?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외식과 집밥은 다시 균형을 이루리라 짐작된다.
이 외식과 집밥의 균형은 국민건강을 위해 다행스럽지만, 외식이 아닌 집밥은 여전히 누군가의 음식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 누군가는 남편보다 아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식 준비는 가사(家事)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힘들다. 그 힘든 가사, 특히 음식 준비를, 남편과 아내가 분담하는 문제는 난해한 수학문제처럼 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남녀불평등이라는, 오래되고 왜곡된 핵심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풀리지 않는 한 어떤 해결방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도대체 남녀불평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신석기시대부터라는 견해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렇듯 남녀불평등은 왜곡된 상태로 참으로 긴 세월 존재해왔다. 여기서 남녀불평등을 오랫동안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쇠막대나 오랫동안 쭈글쭈글한 상태로 있는 철판에 비유해보자. 뒤집어보면 남녀평등은 구부러진 쇠막대나 쭈글쭈글한 철판을 바르게 편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우리는 쇠막대나 철판을 바르게 펴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높은 압력으로 눌러 펴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엄청난 힘과 막대한 자금으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흠을 남기지 않고 쇠막대나 철판을 펼 수 있지만, 약간이라도 압력이 높거나 낮으면, 펴지는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남자나 여자 어느 한 편이 유리하든가 불리하게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첫째 방법과 둘째 방법을 병용하게 될 텐데, 그래도 여전히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뜨겁게 달구어 펴는 방법이다. 이는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가공할 때처럼 쇠를 반 용융상태로 뜨겁게 달구어 펴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도 망치로 때리거나 압력을 가해 누를 수밖에 없겠지만, 가열하기 때문에 앞의 두 방법보다 흠 없고 편평한 쇠막대나 철판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반 용융상태로 뜨겁게 달구는 것이데, 이는 개개인의 본질적 변화를 통해, 남녀의 원래 본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진정한 남녀평등이 남성의 여성화나 여성의 남성화가 아님을 잘 안다. 이상적 남녀평등은, 남성이 내면에 지닌 여성성에 힘입듯, 여성도 내면에 지닌 남성성에 힘입어, 통합된 남성과 여성으로서 평등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다. 이런 남녀평등의 생각과 실천이 현실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바이러스가 다시 오건, 외식과 집밥의 균형이 깨지건 간에, 우리는 남녀평등의 집밥을 먹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