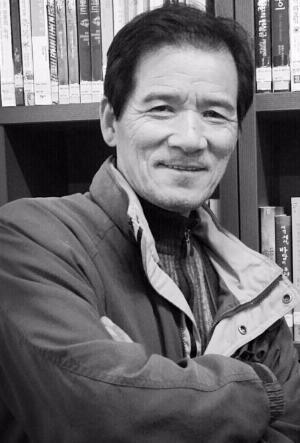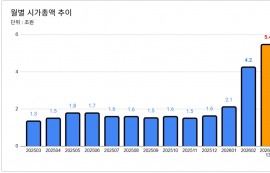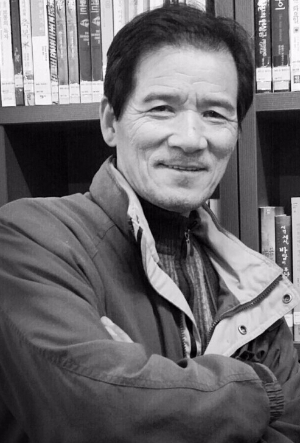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오랜만에 고궁 산책을 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자가 수시로 날아들고,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라서 산행 약속이 고궁 나들이로 바뀐 덕분이다. 창덕궁에서 시작하여 비원을 거쳐 창경궁까지 걸었다. 한여름의 고궁은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푸르렀다. 비 오는 날의 고궁 산책은 오래된 전각들과 비에 젖은 숲 냄새, 함초롬히 비에 젖은 꽃들이 흘리는 향기까지 더해져 산책의 운치를 더해 준다.
창덕궁 후원을 흔히 비원(秘苑)으로 부르지만, 이곳은 결코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다. 조선 초기부터 후원(後苑)·북원(北苑)·금원(禁苑)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고종 이후, 일제 강점기에 비원(秘苑)으로 불렸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거스르거나 훼손하면서 정원을 꾸미지 않았다. 작은 동산이나 계곡, 하찮은 실개천이라도 생긴 그대로 이용하고 풍광을 해치지 않게 정자나 누각을 세워 풍광을 한층 빛나게 하고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그러고 보면 창덕궁 후원은 정원이라기보단 원림에 가깝다. 낙선재를 지나 북쪽으로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면 언덕 아래로 네모난, 마치 한 송이 연꽃처럼 예쁜 정자가 눈에 들어온다. 부용정이다. 마침 연지에는 연꽃 두 송이가 피어 우리를 반긴다. 한국 정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네모난 곳에 가운데 둥근 섬이 있는’ 방지원도(方池圓島)형 연못인 부용지를 둘러보고 다시 발길을 옮겼다.
비원 안엔 크고 작은 연못과 정자, 즉 부용지, 규장각, 영화당, 주합루, 서향각, 영춘루, 소요정, 태극정, 연경당 등이 있다. 절묘한 솜씨로 탄생한 부용지, 애련지, 관람지, 옥류천 정원이 펼쳐진다. 4개의 정원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작고 은밀해진다. 특히 물이 흐르는 시내인 옥류천(玉流川)은 매혹적이다. 후원 북쪽 계곡물을 바위인 소요암에 홈을 파서 물길을 끌어들여 작은 폭포로 떨어지며 옥류천이 시작된다. 작은 시내와 함께 후원을 후원답게 해주는 것은 아늑하고도 짙푸른 숲을 이룬 약 2만5000여 그루의 나무들이다. 이 중에는 수령이 수백 년은 족히 넘은 나무들도 많다.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나 어디에나 뿌리를 내리고 최선을 다해 산다. 나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다. 고궁을 거닐며 나무들을 좀 더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설사와 동행하는 산책이라서 그리할 수 없었던 게 못내 아쉽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옛사람들의 자연관이 일견 부럽기도 하고, 그저 꽃이나 희롱할 뿐 자연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현실이 갑갑하기도 하다. 오늘도 어딘가엔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어딘가엔 산사태가 나서 자연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고 순리를 벗어난 삶을 살아온 탓이 아닌가 싶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이다.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모두 위태롭다. 지금 우리에겐 무턱대고 바쁘게만 살기보다는 비 오는 날, 고궁 산책을 하다가 툇마루에 걸터앉아 기왓골을 타고 떨어진 낙숫물이 작은 물웅덩이를 만드는 것을 무심히 지켜보는 ‘비멍’을 즐기는 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