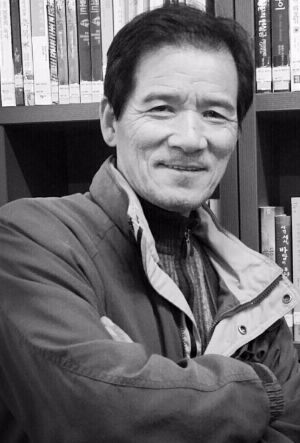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다양한 형상의 바위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바위는 선(禪)바위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마치 스님이 장삼을 걸치고 서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바위에 기도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 하여 기자암(祈子岩)으로 불렸다고도 한다. 동행한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양도성 축성 시기에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선바위를 두고 의견이 달랐다고 한다. 무학대사는 선바위를 도성 안에, 정도전은 도성 밖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도전이 선바위를 도성 안에 두면 불교가 성하고, 밖에 두면 유교가 흥할 것이라고 태조를 설득해 도성 밖에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나는 인왕산을 오를 때면 으레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떠올리곤 그림 속을 걷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국보 제21호인 인왕제색도는 진경산수화의 걸작이다. 비 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풍경을 잘 표현한 겸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영조 27년(1751년), 76세의 겸재는 병석에 누운 육십년 지기 사천 이병연을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 비 그친 뒤, 물안개가 피어올라 개어가는 인왕산의 모습처럼 벗이 하루빨리 병석을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린 그림이 인왕제색도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동문수학한 이래 여든을 넘길 때까지 장수를 누리면서 긴 세월 시와 그림을 통해 사귀었다. 정선이 그림을 그려 보내면 이병연이 시를 짓고, 이병연이 시를 지어 보내면 정선은 그림으로 화답하며 두 사람은 조선 최고의 시화를 남겼다.
선바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도성 안으로 들어서 성곽 길을 따라 정상을 향해 걸었다. 임종을 앞둔 친구의 쾌유를 빌며 그린 인왕산을 오르다 보니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었다. 그림을 그린 며칠 후 사천은 세상을 떠났으니 겸재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림도 친구의 운명을 바꾸진 못하였다. 생로병사는 목숨 지닌 자의 숙명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다. 바위산이다 보니 유난히 계단이 많고 가파르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몇 번을 쉬었던가. 쉴 적마다 걸어온 길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나이 든 탓인가.
허위허위 정상에 올라 땀을 식히고 성곽 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 길, 북한산의 원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렸다는 몽유도원도의 대상이 되었던 풍경이다. 하산길에 들른 윤동주 문학관은 월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다. 문학관 뒤 시인의 언덕을 거닐며 잠시 숨을 고르고 시심에 잠겨 본다. 문학관 외벽에 '새로운 길'이란 시가 눈길을 잡아끈다. 걸어도 걸어도 길은 늘 새롭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나의 길 새로운 길//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내일도……//내를 건너서 숲으로/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의 ‘새로운 길’ 전문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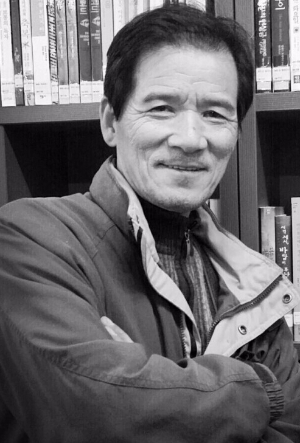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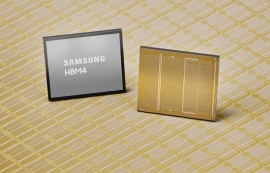








![[르포] 갤럭시 S26 시리즈 실물 공개 첫날..차분한 분위기 속 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6590706624ea14faf6f51232162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