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에 시장은 ‘PBR 테마’가 주도할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공매도 제한, 금투세 폐지 등 여타 정책보다도 훨씬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셈이다. 이로써 한 가지 증명된 것은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의 주된 원인이 정책이 아닌 기업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PBR 1배와 같은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페널티를 주기보다 부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상장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대표적으로는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를 꼽을 수 있다. 상장사는 상속 시 시가로 평가하지만 비상장사는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PBR 1배 이하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최대주주 지분 관련 상속세는 PBR 1배 이하를 유지(상장)했을 때보다 부담이 커진다. PBR 1배 이상을 유지했을 때 상속세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과 비상장은 자금조달과 브랜딩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상장사가 비상장사 대비 외부 간섭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을 위한 기반 측면에서 보면 차원이 다르다. 상장사가 비상장사 대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기업이 PBR 1배 이상을 유지하든, 비상장사가 돼 그 절차를 따르든 상관없다. 어느 쪽이든 PBR 1배 이하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입되는 상속세보다 많아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장 폐지’가 답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번 정책의 ‘지속성’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개념과 지키면 좋은 개념의 결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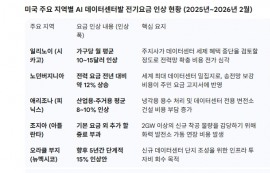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