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최근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보다 제도를 쉽고 체계화시켰으며 상장 재도전 기업 신속 지원 등으로 접근성을 높였고, 주관사 책임성 제고 장치 제도화와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으로 다수의 바이오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바이오 붐이 올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붐을 활용해 소위 말해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상장을 지연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즌과 이후 다양한 바이오기업들이 높은 몸값으로 상장했다. 고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상장 후 기술개발을 하다 임상 지연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매출 30억원은커녕 10억원도 달성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이기에 수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번 자본을 빨아들인 바이오기업들이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책이 없다면 우후죽순으로 상장한 근본 없는 바이오기업들이 산업 전체를 망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서 바이오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을 판별할 때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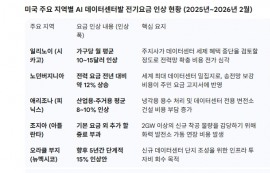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