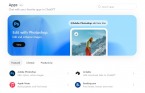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국제정치학 박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21세기 들어 청정에너지 시대와 북극항로 개방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이 바다를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바꾸고 있다. 고대 지중해가 유럽·아프리카·아시아를 잇는 문명의 교차로였다면, 동해는 이제 한국·일본·러시아·미국·북극을 연결하는 21세기의 신(新) 지중해로 부상하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수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며, 해상 운송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EA는 2030년 글로벌 수소 거래량이 연간 9천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현재 LNG 해상 거래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동해가 이 거대한 청정에너지 해상 운송의 핵심 관문과 시장이 될 잠재력을 보여준다.
포항은 수소환원제철을 통한 철강업 탈탄소화의 실증 기지로 발전 중이다. 고대 베니스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부산·울산·포항은 바로 '21세기 베니스'로 거듭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동해는 천연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니가타·홋카이도 지역은 해상풍력과 수소 생산 잠재력이 크지만 내수 시장이 제한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청정수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섭 박사는 "한일이 공동 대량 구매에 나서면 중동·호주산 청정수소 가격 협상력이 30%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울산과 니가타, 포항과 홋카이도가 각각 수요와 공급의 거점으로 연결될 경우 win-win 협력이 가능하다.
북극항로의 현실화도 동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가 북극항로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북극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변수'가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동해 서안의 청진·김책 등 주요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동해의 완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북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제 제재 상황에서는 인도적 에너지 지원이나 환경 기술 교류 등 비정치적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법이다.
국제 표준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EU·일본이 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기준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 중국은 저가 공급망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누가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느냐가 곧 시장 주도권을 의미한다. 동해를 둘러싼 한국의 위치는 바로 이 경쟁의 중심축에 있다.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동해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동-말라카 해협-한반도로 이어지는 단일 에너지 수송로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제임스 해킷 국제전략연구소(IISS) 박사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동해를 통한 북극 에너지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현실적 대안이다.
동해의 신 지중해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한일 간 청정에너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제한적·실용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과의 인도적·기술적 협력 채널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해는 더 이상 일본 열도에 가로막힌 한반도 동쪽의 막다른 바다가 아니다. 청정에너지 시대와 북극항로 시대가 교차하며 탄생한 새로운 기회의 무대다.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Mare Nostrum)'라 불렀듯이, 우리는 동해를 '우리의 청정에너지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국가적 과제다. 동해의 새로운 이름,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 좌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