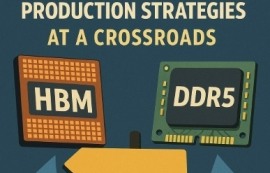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와 도쿄대학 등 공동 조사팀이 201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농도 희토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저 6000m 심해에 1600만 톤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희토류 매장량 기준 세계 3위 규모다.
당초 지난해 시범 채굴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영국 기업에 발주한 채굴 파이프의 제조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로 늦춰진 상태다. 해저 깊은 곳의 퇴적물을 지상으로 퍼 올리는 게 시험 채굴의 1차 목표일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다.
채굴 비용만 최소 120억 엔(약 1120억 원) 이상으로 추산 중이다. 일본은 2022년 이바라키현 앞바다 수심 2500m 지점에서 해저 퇴적물 채취에 성공한 경험도 있다.
2010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충돌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에 맞서 일본이 독자적인 자원 개발을 추진했고, 이번에 시추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하루 350톤가량을 본격 채굴하고 2028년 이후 상업 생산을 준비 중이다.
도쿄대학 연구팀은 하루 3500톤을 채굴해야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 난제도 많다. 해저 6000m에서 진흙 덩어리를 끌어 올리는 기술부터 정제 기술까지 모두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과 협력해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려는 게 이번 미·일 희토류 각서를 체결한 진짜 이유인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광물자원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배워야 할 일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자원 무기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