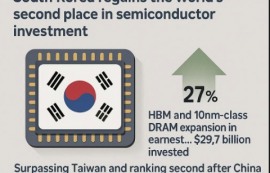요즘 웹 사이트는 열자마자 당장 닫고 싶은 기분이 든다. 우선은 앱의 다운로드를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도록 재촉하는 대화상자가 열린다. 다음에 통지의 허가를 구하게 되어 대량의 광고나, 광고 브로커를 오프로 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까지 따라온다.
야한 팝 업과 페이크뉴스 그리고 혐오스러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팟 캐스트나 개인용 Slack의 채널 혹은 'Apple News'와 같은 앱을 사용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웹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싶을 정도다. 그러나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현재의 웹은 팀 버너스리가 30년 전 분산 형 하이퍼텍스트 시스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유럽원자핵연구기구(CERN)에 제안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버너스리는 그 방안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기록하기 위해 1980년에 개발한 ‘Enquire’라 불리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버너스리는 이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확장해 연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은 중앙집권이 아닌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너스리는 “정보시스템은 처음에는 규모가 작지만 갈수록 커져 간다”라고 지적하고 “시스템은 처음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 새로운 시스템은 중앙집권이 아니고, 어떠한 조정이 없어도, 기존의 시스템과 서로 링크 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메인프레임 시대의 컴퓨터시스템처럼 하나의 서버가 한 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서버가 상호 접속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의 상사였던 마이크 센드르가 막연하긴 하지만 가슴이 뛴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버너스리는 몇 개의 ‘세계 최초’ 개발에 착수했다.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 웹서버, 페이지의 작성에 사용되는 ‘HTML’이라 불리는 단순한 언어, 그리고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정보교환에 사용되는 ‘HTTP’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웹브라우저가 고도화 되면서 웹의 표현도 풍부해졌다. 미 국립슈퍼컴퓨터응용연구소(NCSA)에서 태어난 웹브라우저인 NCSA Mosaic(모자이크)은 온라인 이미지를 세상에 확산시켰다.
이 NCSA Mosaic의 개발자들이 창출한 새로운 브라우저 ‘Netscape’는 페이지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보다 고도의 수단을 제공했다. 더욱이 중요한 것으로 ‘Netscape 2.0’은 1995년 후반에 프로그래밍 언어 ‘Java Script’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개발자가 사이트에 새로운 쌍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초기 ‘Java Script’는 극히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의 폼에 기입하여 ‘송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든 필요항목이 기록되어있는지 체크한다는 것이다. 그 후 Java Script를 포함한 웹의 기술은 2006년까지 보다 유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Google 문서’와 같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진화는 희생도 수반됐다. 일반 웹 사이트의 파일크기가 2016년경까지 슈팅게임인 초기 ‘Doom’의 1993년판과 비슷한 용량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광고나 트래킹용 스크립트에 의해 지금은 심플한 웹 페이지에서조차 복수의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정도의 용량이 되었다. 그 후도 이러한 ‘표준’은 비대해져 갔다.
기초가 되는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진화한 덕분에 웹은 더 유용하고 귀찮아졌다.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여는 기능은 편리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골칫거리가 된 팝 업 광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브라우저의 개발자는 팝 업 광고의 출현에 팝 업 블로커를 브라우저에 탑재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2010년 ‘WIRED US판’은 웹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기상조였다. 이유의 하나는 웹의 콘텐츠에 링크한다고 하는 개념이 소셜미디어의 융성으로 연결되어 간 것이다. 그리고 웹이 기세를 더하고 그 기초기술이 모바일이나 PC의 앱의 구축에도 이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Slack나 Discord, Spotify와 같은 앱의 PC판은 구글에서 태어난 오픈소스 프로젝트 ‘Chromium’의 웹 브라우저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요약하면 그러한 앱은 특정 웹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웹 브라우저이다.
무수히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OS 마다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버너스리 첫 번째 제안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어느 시대에나 웹은 크로스 플랫폼이었다. 최근에는 원어민 앱을 만들기 위해 웹 기술을 응용할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GitHub이 개발한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Electron’은 Slack나 Discord의 개발에 사용되었다. 또한 페이스북이 개발한 ‘React Native’는 Java Script를 이용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지지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용 코드에디터 툴 ‘Visual Studio Code’의 개발에 Electron을 채용하고 있다.
반드시 웹브라우저로부터의 ‘전용’이 아닌 앱 조차 웹의 기술에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Apple News’나 포드 캐스트의 앱은 소리에 의한 통지에 웹의 ‘RSS’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앱은 뒤쪽에서 서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버너스리가 고안한 HTTP를 계승하는 프로토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웹은 앱 대두에 의해 매장되는 대신 그 유용성을 증명했다. 자신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 컴퓨팅을 ‘재창조’ 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