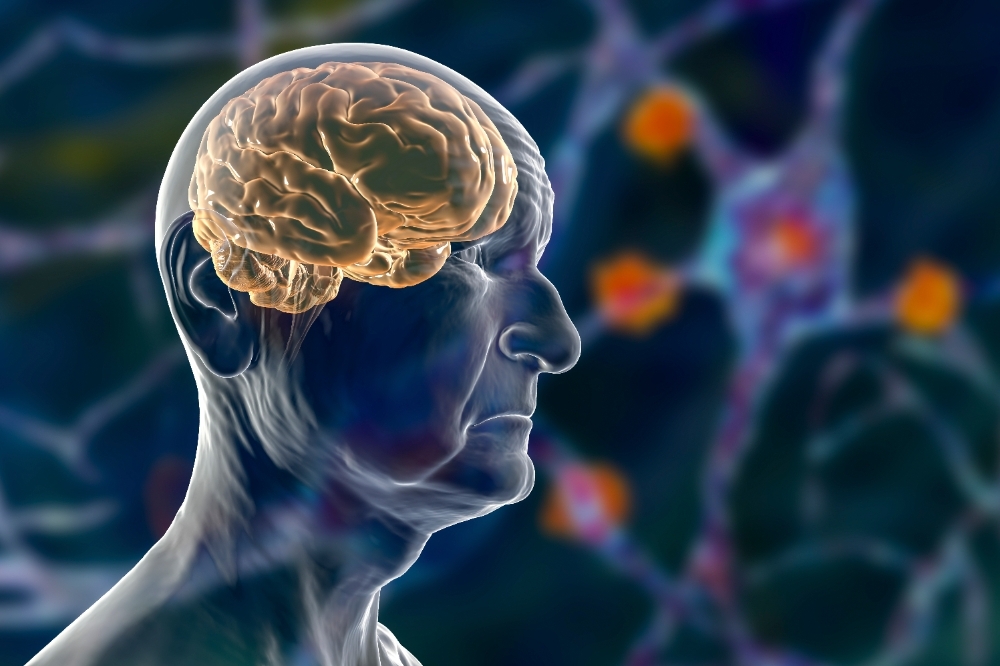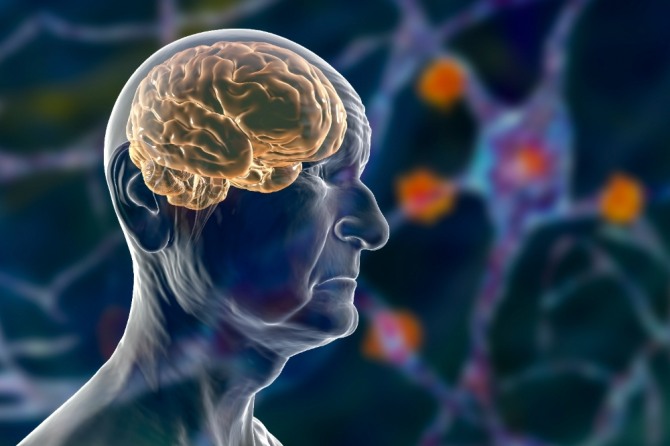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줄기세포는 높은 증식 능력과 다양한 세포 유형을 생성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법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퇴행성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등 신경 인지 장애의 유일한 증상 개선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뇌 질환의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임상 의사들은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은 질환의 발생 기전을 토대로 치료의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대책이 없어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더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체외 분화, 뇌 실질 주사 등 환자나 보호자가 강한 치료 요구를 하면서 의사의 면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
임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책임 소재를 다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뇌 질환 환자들과의 치료 과정에서는 보다 상세한 수술 동의서와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확인하는 일종의 계약서 2~3종류가 필요하다. 환자에 따라 설명은 달라질 수 있고 첫 상담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뇌 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 번째로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있다. 이는 신체 전반에서 발생한다. 주로 유전자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세포지질을 과산화시킨다. 현재의 치료 방법은 항산화 치료와 ROS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완전한 재생은 불가능하다. 이 때 재생 과정 중 세포 분열에서 유전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투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경계염증(neuroinflammation)은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자가면역 반응이 주 원인일 수 있어 면역 반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적합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현재 약물 개발 분야에서는 신경세포 주변의 글리알세포와 성상세포를 지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도 줄기세포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실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세포 개수와 투여 방식을 정하는 문제만 남아있다.
만약 정맥 투여를 한다면 1000억 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의 투여 방식으로는 스테레오택틱(stereotactic) 기술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MRI나 CT를 보면서 뇌의 실질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난이도가 높다.
뇌와 척수 사이의 액체인 뇌척수액에 투여하는 방식은 뇌-혈류 장벽(BBB;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부 연구에서는 만니톨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만니톨로 뇌를 일시적으로 수축시킨 후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다시 부풀면서 줄기세포를 흡수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경동맥을 통해 줄기세포를 주사하거나 인터벤션(intervention) 기술을 이용해 문제가 있는 뇌의 한 부분으로 가는 주사관을 넣어 주사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세 번째로 세포사멸(apoptosis)은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데 이는 산화 독성일 수도, 분열의 실패일 수도 있다.
뇌는 꾸준히 재생되는 기관이다. 어떤 이유라도 세포 분열이 지연되거나 분열 후 바로 사멸하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세포의 문제이므로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가 줄기세포가 혈관 증식과 이상 단백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글리알세포가 재생되지 않으면 마치 흉터처럼 단단해지면서 수축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 문제도 건강한 세포로부터 세포 외기질을 분비해 해결해야 하므로 줄기세포가 필요하다.’
다른 원인으로는 흥분성 물질 분비(exocitotoxicity)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체 기능 이상(mitochondrial dysfunction)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화로 인한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다. 유전적 변화로 인해 엉뚱한 단백질이나 뇌 신경에 해가 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면 면역 반응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분열 과정에서 계속 유전자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미토콘드리아의 산화를 막는 약물도 있지만 이는 미토콘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아이쉬와라 우메시 프라단(Aishwarya Umesh Pradhan) 등이 브레인앤비헤이비어(Brain and Behavior) 저널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는 “줄기세포는 증식할 수 있고 여러 세포 유형을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치매(AD)와 파킨슨치매(PD)와 같은 신경인지 장애의 치료 옵션으로서 줄기세포 요법이 점점 더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펍메드에 공개된 영어 논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 중 대다수는 다능성이자 신경 발생 및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중간엽 줄기세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세포 사멸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뉴런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성장 인자, 뉴로트로핀 및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면서 발생해 재수초화와 재생을 돕는다. 또한 다양한 면역 세포와 상호작용을 통해 항염증 효과를 일으킨다”고 전했다.
자가유래 골수나 지방 조직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10 , Guillot-Sestier et al., 2015 ). AD의 병인에 관여하는 과정에는 증식, 세포사멸, 혈관신생, 염증, 면역조절 등이 포함된다.
줄기세포 이식은 이러한 과정을 상황에 따라 천연적으로 분화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큰섬유모세포’의 장점 때문이다. 이 외에도 Aβ 플라크 제거, 세포사멸 억제 효과, 신경 발생, 혈관 신생 등이 있다.
Aβ 플라크 제거 기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동물 모델에 대한 연구는 Aβ-펩티드가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뉴런의 세포사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Goldberg et al., 2015 , Oh et al., 2016 ).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식된 줄기세포가 Aβ 분해 특성을 갖는 네프릴리신 분해 효소, 인슐린 분해 효소, 엔도텔린 전환 효소와 같은 효소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줄기 세포가 해마 Aβ 플라크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Harach et al., 2017 , Oh et al., 2016 ).
정맥을 통해 주사된 세포는 뇌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Oh et al., 2016 ), 그곳에서 뉴런 유사 세포로 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콜린 아세틸트랜스퍼라제(ChAT) 발현이 관측됐다(Lees & Smith, 1983 ). ChAT의 발현은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 후 신경 발생의 잠재적인 메커니즘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항상성 유지는 유사한 기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뇌질환에서는 VEGF와 같은 염증 증가 물질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처 치유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염증이다. 혈관 신생과 기존 혈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가 혈관으로부터 실질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뇌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신경염에서 단순히 염증 물질의 증가를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VEGF가 증가하면 신경성장인자(NGF) 증가와 연계될 수 있어 다른 전공과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포 증가의 원인은 세포 기능 손실 한 가지 뿐이다. 이상 대사 물질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전구 물질 이상을 교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가지 파급 효과가 5가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은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세포의 손상과 기능 이상을 통합해 해결할 수 있는 천연 원리인 줄기세포 치료 외에는 재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필자의 견해로는 의약품 소재는 순도보다는 복잡도, 명확한 재현성 입증보다는 천연적 항상성 유지에 기대고 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치료다.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뇌 질환자에게는 연구의 재현이나 명확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욱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연구 논문을 쓰듯이 과도하게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뇌 질환 동물실험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성공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실험 중에는 정맥 투여 대신 직접 뇌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배아줄기세포나 유도만능세포는 종양 형성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간엽 세포는 종양은 형성하지 않으나 그만큼 치료 효과도 다소 떨어진다고 알려졌다.
체외 배양 단계에서 신경세포로 유도하더라도 실제 세포 환경이 플라스크와 다르면 전혀 다른 세포로 바뀔 수 있다. 플라스크에서 완벽한 뉴런이 형성된 걸 확인했어도 주사 이후에는 어떤 세포로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체외 분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각각의 병소에 맞도록 모양을 바꾸어 가는 것이 줄기세포이므로 자가 유래 세포를 사용하는 경우 배아줄기세포보다 회복이 느려도 ‘큰 섬유모세포’를 사용한다. 큰섬유모세포는 비교적 쉽게 변하므로 조직에 맞는 전환 분화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동결건조한 돼지 뇌에 인간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사했을 때 신경세포와 유사한 형상이 나타났던 경험이 있다. 발생단계에서 뇌와 상피세포는 근원이 모두 외배엽성이다. CNT-7 배양액에 중간엽 세포를 배양하면 원래는 먼저 상피화되고 역분화가 따라야 하는데 종종 500미크론을 넘는 긴 연결 가닥을 형성하고 양 끝에는 성상세포가 존재해 사실상 뉴런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 이후의 치료에서는 체외 분화배양은 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줄기세포 치료는 뇌 질환의 증상 회복을 위한 현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실제 임상 사례는 적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뇌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자가유래 줄기세포(지방, 골수, 피부, 후각신경 상피세포 등)로 다양한 투여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유일한 것 같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사장 이희영은 누구?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사장은 1991년 성형외과 전문의로 의료계에 발을 내디딘 후 지방 성형을 자주 접하면서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대량 지방이식을 시작했다. 특히 전문의로서 지방조직을 연구하던 중 의대에서 배운 것과는 다소 다른 지방이식에 관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줄기세포치료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2007년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를 설립, 동료 의사들과 함께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