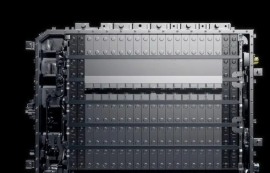과거와 현재 잇고 미래의 영감 주는 기업문화 활동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틀간 열리는 기념행사의 중심에는 한때 지역 베들레헴 철강공장에서 3만 명 이상이 일했던 전직 철강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베들레헴스틸의 ‘철의 주말’ 행사는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기업문화 활동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철강 노동자 아카이브의 대표인 전 베들레헴 스틸 직원은 "철의 주말을 통해서 과거에 근무했던 철강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이크를 갖게 되며, 올해의 이야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베들레헴스틸의 옛 전기 수리점에 있는 국립 산업사 박물관과 철강 노동자 기록 보관소는 수많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NMIH의 컬렉션 큐레이터인 안드리아 자이아에 따르면 ‘철의 주말’은 첫 번째 모임을 가진 후 (매년) 철강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재회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고 한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는 진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철의 주말’ 계획은 일 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 다음 해의 모임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행사의 커뮤니티 파트너 대표들과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철의 주말’에 참석하는 이들은 과거의 일들을 ‘사랑의 노동’이라고 말한다. 철강 가족이었던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근무하면서 체험한 일들과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한 것은 철강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내가 근무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새로운 세대와 공유하는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이다"
72세의 메이어는 베들레헴 스틸의 3세대 직원이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근처 이스트 4번가에 있는 공장에서 남쪽으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50년 동안 일하셨고, 크레인 운전사였다"
"나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36년 동안 일했고 존경받는 노조원이었다"
"나 역시 그곳에서 22년 동안 일했다"
"나는 1974년에 고용된 마지막 큰 물결의 일부였다"
"저는 루프 프로그램을 졸업했고 중간 관리에서 감독관을 맡았다"
이 같은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의 일했던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준다.
일반인들이 베들레헴 공장을 견학한다면 어쩌면 베들레헴 공장 투어 가이드로 일하는 전직 철강 노동자 중 한 명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전직 베들레헴 근무자였던 메이어는 지금 공장의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공장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본도 필요 없다. 내가 살아온 일과 나의 열정을 담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철의 주말’은 2일간 열린다. 두 날 모두 오전부터 흥미로운 워크샵 시연으로 시작된다. 참여자들은 이 시간동안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철강제품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현장을 볼 수도 하고 있다. 리벳이 다리, 건물, 선박 건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매일 오전 11시에는 베들레헴 주민이 현지 공장의 현대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설치한 혁신적이고 수상 경력이 있는 59인치 압연기에 대해 토론하고 설명한다.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제 훈련 공장을 시각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 이 복제품은 최근 NMIH 교육 센터에서 재조립되기 전에 웨스트 베들레헴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베들레헴 공장에서 기업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공정과 디자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플라스틱 밀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59인치 압연기
1980년대에 베들레헴 스틸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해 혁신적인 59인치 압연기의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었다. 최근, 훈련 공장은 창고에서 꺼내져 국립산업역사박물관에서 다시 조립되었다.
NMIH 광장에서 매일 정오에 '철의 음식'을 제공한다. 베들레헴 스틸의 그늘에서 1년 365일, 주 7일 동안 공장에 보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각자의 민족 음식을 내놓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근무했던 각 민족은 그들만의 이웃과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한때 남베들레헴에는 35개의 교회가 있었다. 스틸공장에서는 62개의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의 장을 갖는 것이다.
철강 노동자들은 주말 내내 유명한 사진작가 에드 레스킨에 의해 그들의 초상화를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박물관 광장에 있는 오픈 마이크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행사는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컨텐츠이다. 작년 개막식 이후, 몇몇 근로자들은 몇 마디하고 싶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 준 것이다.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일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할 수 있는 ‘큰 마당’은 기업문화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연결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
이번 주말은 다세대 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베들레헴 철강이 소유한 1941년 식 디젤 기관차의 조종을 참가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관사 체험도 있다. 인근 바나나 공장은 산업 연구 미술 전시장이며, 사우스 베들레헴 방문자 센터에서 조각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주말의 주요 주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이었던 볼티모어 근처의 베들레헴 철강의 스펠로우 포인트 공장에 대해 다루게 된다. 스펠로우 포인트는 베들레헴 철강이 소유하고 있는 스펠로우 포인트 조선소에 재료를 제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들레헴스틸은 CEO 유진 그레이스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하루 이상의 배"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15척이나 초과하면서 1127척의 배를 건조했다. 이 선박이 그 유명한 전시 표준선 리버티 선박을 말하는 것이다.
리버티 선박은 미국에서 유럽까지 물자를 막대한 전쟁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 이후 한국 전쟁 당시에도 함남철수 당시 한국인들을 부산으로 인전하게 수송했던 역할도 했었다.
베들레헴 공장이 문을 닫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의 초점은 스펠로우 포인트에 있다고 한다. 생산 활동이 어떻게 끝났는지, 직원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스펠로우 포인트(Sparrows Point) 은퇴자들은 주말에 참석한다.
토마스 스패로우(Thomas Sparrow)의 이름을 딴 스펠로우 포인트는 제강과 조선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베들레헴스틸(Bethlehem Steel)이 소유한 철강 산업 단지의 부지였다. 20세기 중반의 전성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였다.
베들레헴 스펠로우 포인트 조선소와 제철소 부지는 환경을 정화하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가 되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트래드 포인트 아틀랜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스펠로우 포인트에는 언더 아모르, 아마존, 홈디포트, 폭스바겐, 맥크로믹 앤 컴퍼니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주문처리센터, 교육로트, 저장로트 등이 있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교육 센터에서 밥 빌하이머가 "세계 최대 조선사–여러분이 모르는 가장 큰 베들레헴 철강 이야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요일에는 스타팅 투모로우, 일요일에는 컨트리 퍼포머 켄달 콘래드가 예능을 제공한다.
‘철의 주말’은 내일의 선각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모토로 한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후대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의미가 담긴 기업문화 활동이다.
지나간 근무자들의 발자취 특히 남녀 철강 노동자들이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철강 노동자들의 유산을 유지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내년에 기업의 나이가 70년을 맞이하는 철강 기업은 현대제철이다. 후년에는 동국제강도 70주년을 맞는다. 오랜 기간 동안의 기업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들레헴 스틸과 같은 기업문화 활동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대부분 20~30여 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나의 인생이 담긴 일"을 그냥 묻어 두지 않는 미국인들의 오늘이 아름답다.
김종대 글로벌철강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