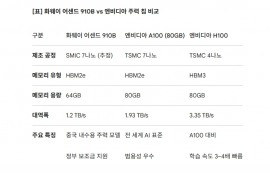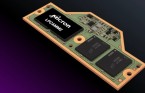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60년대의 한국 철강 산업은 시작단계의 일천한 수준이었다. 전국토는 재건의 메아리가 가득찼으나 고철이 부족해서 마땅한 철강제품의 생산이 어려웠다. 그랬으니 넝마주이 행색을 한 젊은이들도 고철 나부랭이를 주워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60~70년대의 가장 큰 고철 수출국은 미국이었다. 당시 국내 전기로 메이커들은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창인지라 고철이 태부족이었다. 고철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 규모가 큰 철강 기업은 동국제강과 인천제철, 극동철강(현YK스틸) 등이었다. 이 기업들은 못과 철선, 철근 제품을 생산했다.
미국 고철 하주(荷主, Shipper)들은 주로 일본(카르텔)과 유럽쪽에만 고철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국은 아예 고철 공급 국가에서 제외됐다. LC개설조차 불투명했던 시절이었다. 이런 한국에 미국 고철을 처음 하역시킨 이는 일본인 사토이다. 그는 슈니처 일본연락사무소 책임자였다. 일본 미쓰비시 출신의 사토는 미국 슈니처 회사의 철스크랩을 일본 선박에 싣고 부산 부두에 1차 하역을 했다.
미국 슈니처 스틸의 정식 사원인 사토와 동국제강의 첫 거래는 선적, 하역, 지불 등 문제없이 마쳤다. 두 번째 거래에서는 선금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신용장도 없이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슈니처 측에서도 거래 중단지시를 내렸다. 미국 고철을 싣고 온 선박은 부산항만의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선금을 받기 전에는 물건을 넘기지 말라고 했다.
사토는 당시 동국제강 장상태(2000년 4월 작고) 사장에게 LC를 개설하든지 대금 일부라도 송금하라는 양자택일을 통보했다. 동국제강 오너 사장과 불 튀기는 대화가 오간 것은 물론이다.
“이보시오. 사토상! 지금 뭐 하는 거요?”<장사장>
“무슨 말씀인지?“<사토>
“저 차들이 당신네 제품을 실어간다고요?”<사토>
“저 사람들이 제품을 실으면 바로 제품 값을 줄 것이고, 우린 즉시 당신에게 고철 값을 줄 것인데 돌아간다면 어쩌란 말입니까”<장사장>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사토는 한국과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고철을 하역하기로 단단한 결심을 했다. 사토가 내린 결론은 ‘매일 필요한 만큼의 고철 물량을 주고, 연리 30%(당시 금리 35~40%. 미국 금리는 6%)의 금리로 미국에서 선적일로부터 실제의 달러 지불 일까지 지불한다’는 조건이었다.
국내 최초의 미국산 고철 수입 과정은 이렇게 신용장도 없이 이뤄졌다. 미국 슈니처스틸은 동국제강과 근 70년 가까이 동반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회사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에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과 경영진 일행은 미국 슈니처스틸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축하연을 같이 했다.
고철 공급자와 구매자는 철스크랩 이외의 사업 분야에서도 서로 격이 없이 토론한다. 전 세계의 최신 정보를 나누면서 각자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타진한다. 실제로 동국제강이 90년대에 중공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검토 과정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장상태 회장과 슈니처 스틸 회장이 밀담을 가진 것은 사사 기록에도 남아있다.
철인들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거래했던 믿음은 삭막한 오늘의 상거래에 작은 울림을 준다.
당시 슈티처 스틸 오너가 사토에게 지시한 말은 ‘Go and See’였다.
김종대 글로벌철강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