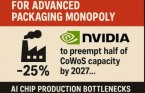대중 수출 의존도 지난해 22.8%에서 올해 1분기 19.5% 낮아져
정유제품,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중국 수출 비중 줄어들어
여전히 정유·석유업계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수출국 중 하나
올 1~4월 수출서 중국은 정유가 4위, 석유화학 제품이 1위로 여전히 견고
정유제품,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중국 수출 비중 줄어들어
여전히 정유·석유업계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수출국 중 하나
올 1~4월 수출서 중국은 정유가 4위, 석유화학 제품이 1위로 여전히 견고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행한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 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18년 26.8%에서 지난해 22.8%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올해 1분기에는 19.5%까지 내려갔다.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줄고 중국 외 수출 시장이 확대된 대표 업종으로는 정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탈중국화는 수출은 물론 수입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제조업체들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거점 다변화 전략이 다 이를 위함이다.
그럼에도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있어 중국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중국이 앞서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압도적인 1위 국가였던 것은 물론 2010년대 들어서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시장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대중국 수출 규모도 2000억달러대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는 약 2억달러가 줄었지만, 순위는 6위에서 2단계 오른 4위에 올랐다. 호주, 미국을 제외하고 수출이 모두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유 제품 수출에서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부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동의 1위 수출국이었다. 수출 규모 면에서는 2위 국가와 차이가 크게 날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다. 실제 2021년 연간 기준 중국 수출액은 68억4200만달러(8조9459억원)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미국(47억4500만달러, 약 6조2040억원)으로 약 20억달러가 넘게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정유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중요한 수출 국가 중 하나"라며 "지난해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연초 들어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은 정유 제품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서도 부동의 1위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인 543억1600만달러(71조670억원) 중 중국 비중은 207억달러(27조838억원)로 38%였다. 2위에 오른 미국(44억6900만달러, 약 5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는 5배가 넘는 규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미약하다"고 했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산업활동 증가와 소비확대 등을 기대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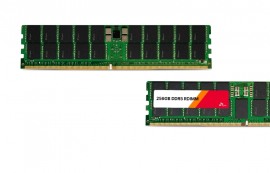
![[특징주] 삼성전자 13만5700원·SK하이닉스 70만원, 최고가 '경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1050923520199144093b5d4e124482321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