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로 재편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주도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과거 자동차 경쟁력은 엔진과 차체, 내구성 같은 물리적 성능에서 갈렸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데이터와 연결되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느냐가 경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플레오스는 이런 변화 속에서 현대차그룹이 스스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대차는 플레오스를 통해 차량 제어 구조를 혁신적으로 단순화하고, 자체 운영체제를 내재화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산업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과 빅테크 기업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장악 시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운데 현대차가 핵심 기술을 직접 보유한다는 것은 곧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단순 조립·판매업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며, 제조업과 IT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승부수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달리는 플랫폼'으로 바꾸고,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를 끌어들이는 개방형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자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더 나아가 모빌리티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물류,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플레오스를 적용한 신차를 내놓고, 2030년까지 200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는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기술 개발의 청사진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전략이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앞세우고, 중국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와 자체 운영체제(OS)로 추격하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안정적 품질, 대중적 가격, 개방형 소프트웨어라는 차별적 조합을 통해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는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구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 수익모델 확보로 이어진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서비스형 산업 구조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쇳덩이이자 기계장치가 아니라 데이터와 연결된 움직이는 플랫폼이다. 현대차그룹의 플레오스 전략은 바로 이 전환기에 한국 산업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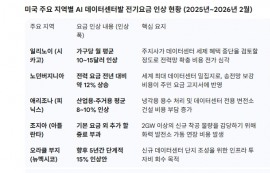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으로 혼조세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703563309056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