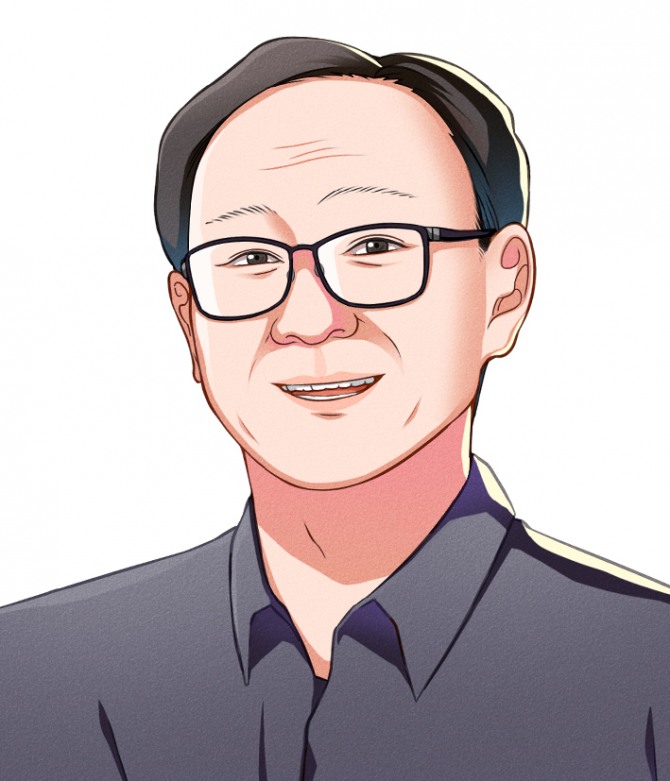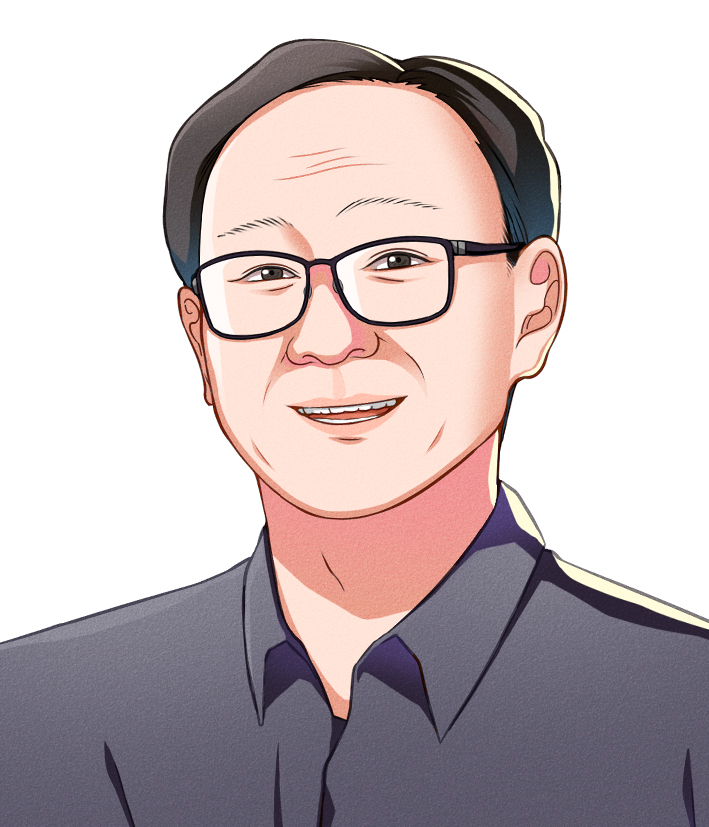위 대화 내용 가운데 4개의 단어에 밑줄을 쳤습니다. 눈치 빠른 독자님은 이들이 과연 맞는 말인지 고민부터 할 것입니다.
이들 ‘금슬’ ‘매고’ ‘가파라’ ‘절은’은 모두 맞춤법에 틀리게 쓰인 단어입니다.
왜 틀렸는지 알아볼까요.
금실/금슬
‘금실’은 거문고와 비파를 뜻하는 금슬(琴瑟)이 원말이지만 ‘금실’로 발음이 바뀜에 따라 의미도 변화된 말입니다. 거문고와 비파소리의 어울림이 아주 좋다는 데서 온 말이죠. ‘금실’은 ‘금실지락’의 준말로서 부부간의 화목한 즐거움이나 애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자 원래 발음인 ‘금슬(琴瑟)’로 읽을 때는 말 그대로, ‘거문고’와 ‘비파’를 뜻합니다.
■
매다/메다
‘매다’는 타동사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실이나 끈, 밧줄 등의 긴 물건을 다른 물건에 두르거나 감아 잘 풀어지지 않게 매듭과 같은 것을 만들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등산화 끈을 매다.”처럼 씁니다.
또 “어떤 대상을 끈이나 밧줄 따위로 고정된 물체에 연결하여 그 대상이 달아나거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뜻일 때는 “강아지 목줄을 나무에 맸다.”와 같이 쓰입니다.
이 외에 “사람이 허리띠나 벨트 따위를 몸에 다소 조이는 상태로 두르다.”란 뜻으로 “배낭끈을 맸다.”처럼 쓰이고, “논밭의 풀을 뽑다.”란 뜻일 때는 “김을 매다.”처럼 쓰입니다.
그렇다면 '메다'는 어떨 때 쓰일까요?
‘메다’는, “물건을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란 뜻으로 "가방을 메다." "총을 메다."처럼 쓰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음식이 빡빡하거나 울음이 복받치어 막히는 듯한 상태가 되다.”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 예문입니다.
또 “구멍 따위가 가득 차거나 막히다.”란 의미로 “하수도 구멍이 메다.”처럼 쓰입니다.
■
가파르다
■
절다
이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는 이 외에도 ‘거칠다/날다/낯설다/허물다’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각각 ‘거칠은’이 아니라 ‘거친’으로, ‘날으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낯설은’이 아니라 ‘낯선’으로, ‘허물은’이 아니라 ‘허문’으로 써야 합니다. ‘땀에 전 옷’은 ‘땀에 젖은 옷’이나 ‘땀이 밴 옷’으로 써도 의미가 같습니다.
‘절다’는 이 외에도 “한 쪽 다리가 짧거나 다쳐서 걸을 때에 몸을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다”란 의미로, “한 쪽 다리를 절다.”처럼 쓰입니다.
따라서 앞 예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배낭을 메고 다정하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이 너무 가팔라 ‘잠시 쉬었다 가자’는 부인의 성화에 잠시 바위에 앉아 땀에 전 옷을 말리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이재경 기자 bubmu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