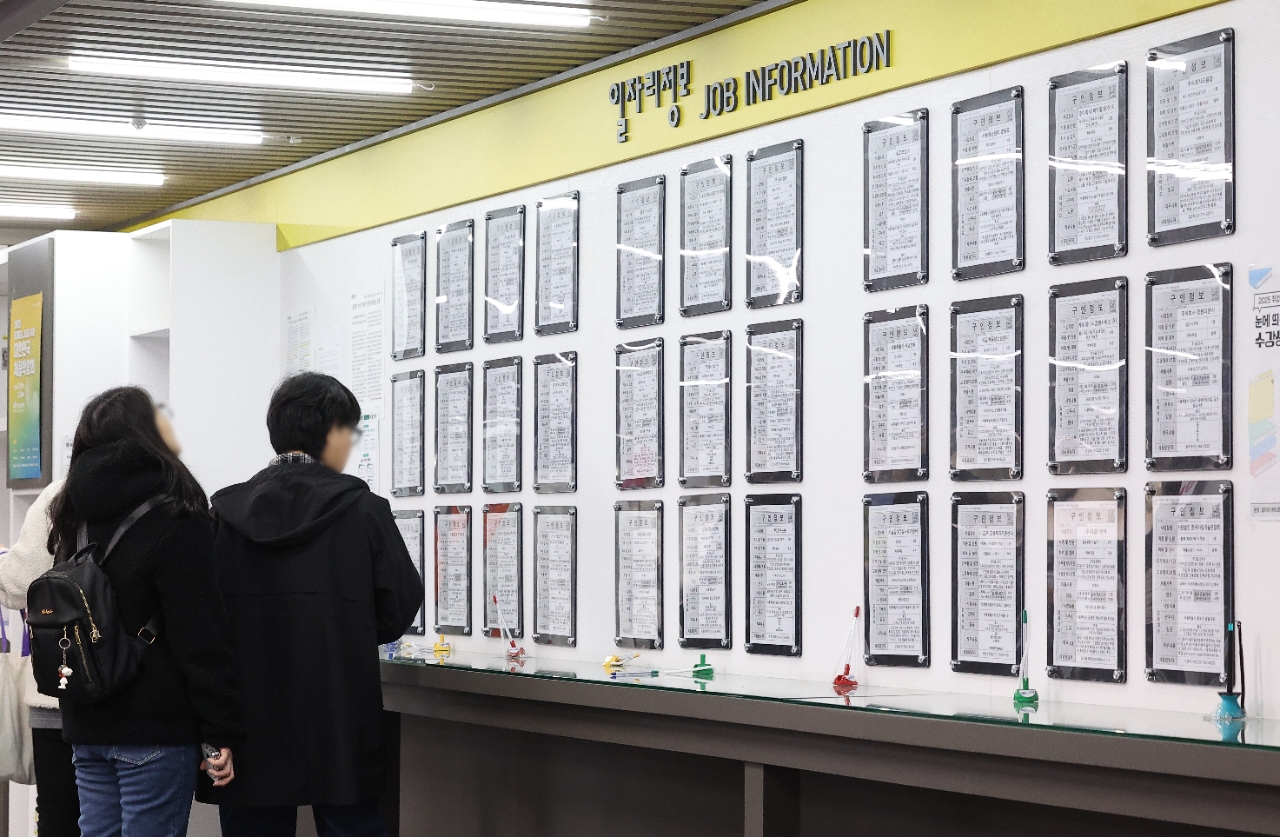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9만2000개와 신규 외국인 유입 일자리 8만7000개를 빼면 실제로는 2만 개나 감소했다. 노인 일자리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이다.
100만 명을 넘긴 외국인 노동자 수도 내국인의 고용 확대로 해석하기 힘들다. 이걸 제외하면 전체 일자리는 사실상 줄고 있는 셈이다. 고용통계에 나타나는 일자리 착시 현상이기도 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소비 둔화도 일자리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49.9%로 최하위권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3.46%다. 실질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57%로 GDP 증가율의 74% 수준이다.
소비 둔화 원인에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부터 높은 가계부채율과 조세·사회보험료 지출 부담도 무시하기 힘들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는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90%를 넘겼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경제성장 저해 기준치인 80%로 낮추기 힘든 구조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도 거침없다.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64억 달러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1년 전보다 9.2%나 줄었으나 그린필드 신고액이나 도착 기준 투자금액만 보면 나쁘지 않다.
이런 정책마저 없으면 민간 소비의 둔화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