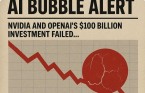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도 2000년 대선 직후 재검표 관련 논란이 벌어지자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그 당시 플로리다주 개표 혼란으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태에 직접 개입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을 판단한 잣대도 미국 헌법에서 나왔다. 우리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 요건이 없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제도를 규정한 연방헌법 제2조 제4항에 ‘중대한 범죄’라고 아예 못 박았다. 이 조항은 “대통령, 부통령 등은 반역죄, 뇌물죄,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소추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과 최후 변론에서도 미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미국처럼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이고,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길기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법체계와 정치 문화, 제도와 관습이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의 판례를 법리적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미국은 극단적인 정파 대결로 두 동강이 난 지 오래다. 지금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막 취임 100일을 넘겼고, 미국과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은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로 치달을 것이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다. 민주당의 슈리 타네다르(미시간) 하원의원은 의회 승인 없는 정부 지출 삭감 시도와 권한 남용, 부패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민주, 조지아)은 상원에서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추진이나 민주당의 탄핵 모색은 모두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국이 이런 작금의 미국을 교과서로 삼으려 든다면 이것은 난센스다. 한국은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을 막아야 할 때이다. 6·3 대선은 그 분수령이 돼야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