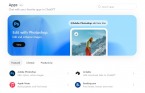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국제정치학 박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탄소 배출량에 가격이 매겨지고, 그 가격이 산업과 무역의 질서를 바꾸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탄소시장의 설치 목적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전체 배출량의 약 28%가 이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청정에너지, 특히 수소산업 지원 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소시장이 수소산업을 위한 자금줄이자 촉매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에 ‘수소’를 새로 포함시킨다. 앞으로는 철강이나 비료 같은 제품뿐 아니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소와 수소 기반 연료에도 탄소비용이 붙는다. 쉽게 말해, 수입품을 만들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만큼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는 뜻이다. 해운과 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재원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EU는 배출권 경매로 얻은 수익을 ‘유럽 수소은행(EU Hydrogen Bank)’에 투입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생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독일의 H2Global은 더블옥션(CfD)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를 수입하고, 국내 수요와의 가격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준다. 영국은 수소 전용 차액계약제(LCHA)를 도입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 모든 제도의 재원은 결국 탄소시장, 즉 ETS에서 나온다. 배출권을 거래하며 모인 돈이 다시 수소 확산을 위한 씨앗자금이 되는 것이다.
미국도 방향은 같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잘 알려진 45V 세액공제가 올해 최종 확정되었는데, 수소 생산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2030년부터는 시간 단위 전력 매칭을 요구할 정도로 무탄소성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그 이전에는 연간 단위 매칭을 허용해 당장 프로젝트 착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모두 탄소시장과 수소 보급정책을 연결해 수소산업의 초기 위험을 줄이고 시장을 열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1킬로그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킬로그램 이하일 때만 청정수소로 인정한다. 또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조달하도록 했다. 수소가 드디어 전력시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은 아직 ETS 수익과 수소 지원을 직접 연결하는 장치가 없다. 또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강, 해운, 항공 분야에서 수소 기반 제품을 정부가 먼저 사주는 공공조달 정책이 절실하다.
결국 탄소시장과 수소산업을 연결하는 고리는 세 가지다. 첫째, 탄소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소의 상대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둘째, 무역 규범이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셋째, 탄소시장의 수익을 다시 수소에 투자하면 산업 전환의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에 해운과 항공 같은 부문별 규제가 확정 수요를 만들어 주면서, 수소는 비로소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탄소시장과 수소의 만남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한국은 제도적 골격을 갖춘 만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들을 놓아야 한다. 탄소시장을 수소 산업화의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