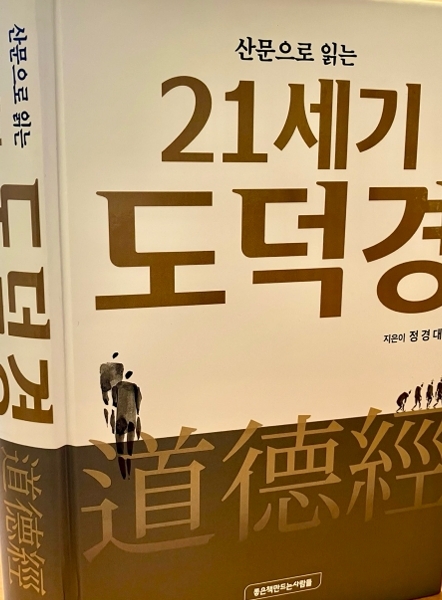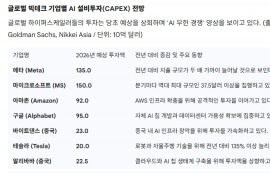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40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비유를 들면 땅의 끝이 유의 시작이고, 바다의 끝은 땅의 시작인 것과 같다. 즉 유무는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각각의 시작점이자 끝이 된다. 이를 계절에 비유하면 겨울의 끝이 봄의 시작이다. 봄과 겨울이 맞물려 있는 그곳이 무이고, 그곳에서 싹을 맺히게 하는 첫 양기가 유의 시작이다.
이처럼 만물의 어머니로서 시작된 첫 물질 하나는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무수한 별과 자연으로 파생되어 온 우주에 가득 찬다. 만물은 가득 차면 반드시 본래 자리인 무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간 무에서 또다시 유가 시작되는 순환을 거듭한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 노자는 이같이 말했다.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부드러운 것은 도의 쓰임이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부드럽다는 것은 기(氣)를 뜻한다. 기는 에너지의 성질과 작용을 일컬음이다.
이와 같이 도의 쓰임새인 기의 부드러운 작용은 천하 만물을 순환시킨다. 하늘의 양기는 오른쪽으로 돌고, 땅의 음기는 왼쪽으로 돈다. 천상천하가 그렇게 순환하면서 자연을 변화시킨다. 즉 성장을 멈춘 자연을 봄에 싹을 내게 하고, 여름에 싹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양기를 가득히 발산시킨 다음, 가을에 다 자란 싹을 음기로 시들어 굳게 하고, 겨울에 성장을 멈추고 무로 되돌아가 잠기게 한다. 이것이 도의 작용으로서 부드러운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은 무인 도가 유인 하나를 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끊임없이 순환한다. 하나는 둘을 생하고 둘은 셋을 생하고 셋은 만물을 생하는데, 셋은 하나와 둘의 합이며 이 합 셋이 태극이 되어 카오스를 일으키면서 만물을 탄생시킨다. 이는 마치 여성 하나가 남성을 만나 둘이 되고, 둘이 화합해 자식을 낳아 셋이 되고, 자식 셋에서 수많은 자손이 번식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태어난 만물은 태어나게 한 본래 자리 영(零·zero)의 상태인 원점, 도의 자리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생을 받아 현실로 되돌아온다. 그렇게 순환하는 도의 쓰임새인 기는 물보다 부드럽게 틈새가 있는 것이든 틈새가 없는 것이든 흘러들기도 하고 젖어 들기도 하고 스며들기도 하면서 만물을 생장시키고 소멸시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운명에도 관여한다. 가령 체질이 차면 추운 추위를 만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병들어 죽음에 이르고, 체질이 더우면 더위를 만나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병들어 죽음에 이른다.
운명도 마찬가지 작용을 한다. 도의 쓰임새인 기가 태어날 때 평등하면 운명도 평등해지지만 치우치는 때를 만나면 불행해지고, 기가 치우쳤으면 평등해지는 때를 만나서 행복해지지만, 더 치우치는 때를 만나면 매우 불행해진다. 거기다가 도의 쓰임새라 할 어느 하나의 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성격도 변한다. 온화하고 덕이 있는 인격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포악하거나 간교한 품성으로 인해 만인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비록 도의 쓰임새로서 그 작용이 한없이 부드러워 덕을 주기도 하지만 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니 도는 절대 권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오직 덕을 베푸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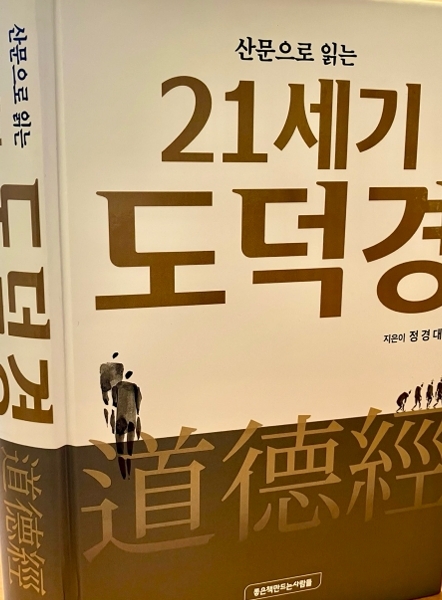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