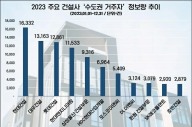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원전해체의 선행요건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의견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원전해체 분야 산·학·연·정 관계자가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협의체로, 2017년 12월 발족됐다. 2019년 7월 3차 회의 이후 2년여간 중단됐다가 지난 8월 다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 승인 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선 비방사선 시설도 방사선 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전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달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조기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재 원안법 체계에서는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달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외 원전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비방사선 시설 선제 해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지난 9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미비를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해체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약 40년간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지난 40년간 가동과정에서 배출한 사용후핵연료 수백t을 고리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국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모두 수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없어 해외에 위탁 재처리만 할 수 있다.
원전업계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도 신규로 넉넉하게 건설할 수 있는데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중단시켜 임시저장시설을 새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탈원전의 일환으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발목을 잡혀 원전해체 산업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분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억제하면서 원전해체산업을 키운다는 구상이지만, 이같은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원전해체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관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원전해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해체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부동산PF 위기 심화] 금융당국, 저축은행 10곳에 증자 요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0819202509905e30fcb1ba8112187240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