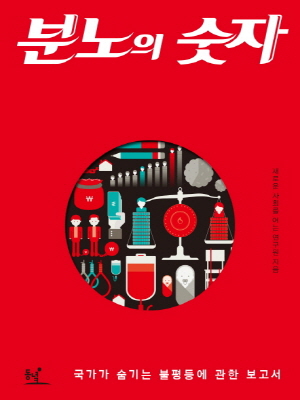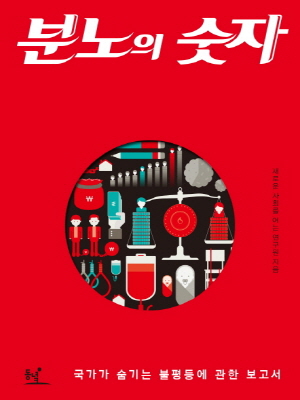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실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경제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독서 토론을 시키기로 했다. 토론을 할 때 근거로 제시하게 할까 싶어 집어 든 책이다. 사실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하여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통계 수치이기도 하지만 불평등에 관한 이 통계들을 보고 있노라면 화가 나거나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에게 들이미는 데는 고민이 필요했다. 토론에 유용한 자료로 쓰는 것도 좋지만, 6학년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부조리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게 해야 할 지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의 에필로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 책을 쓰면서 떠나지 않았던 고민은 ‘분노에 무슨 힘이 있는가?’였습니다. 분노를 강요하는 책이 아닌,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길 바랐습니다. 이 책은 한국사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통계에 기초해 있지만 단순한 통계의 나열이 아니라 이를 우리 삶의 궤적에 맞춰 재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자주 경험하지도,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 또한 분노한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내 일처럼 함께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뜨거움을 가지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메르스 사태로 나라 안이 뒤숭숭하다. 많은 이들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 일처럼 해결하려 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깊은 한숨이 절로 쉬어진다. 메르스 발병 국가 누계 2위라는 신기하고도 새로운 분노의 숫자가 또 만들어지려나 보다.
오여진 서울상원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