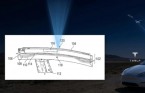시장 필요로 발생하는 양질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2년 동안 2만3000명 늘어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질 낮은 단기 일자리인 '공익활동형'은 18만8000명 늘어난 셈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4조3000억 원 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사업이다.
유형별 예산 규모를 보면 실업 소득 유지·지원 10조3000억 원, 고용장려금 6조5000억 원, 직접 일자리 2조9000억 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규모는 실업 소득 유지·지원이 2조4000억 원(30.7%)으로 가장 크고 직접 일자리(8000억 원·37.6%)가 뒤따랐다.
노인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61만 명보다 13만 명 증가한 74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월평균 보수는 27만 원이었다. 이를 올해 기준으로 적용하면 74만 명의 73%는 월 30만 원도 못 버는 셈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학교 급식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면 민간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은 13만 개에 불과했다.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 등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시장형 사업단', 경비·간병인 등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연계해주는 '취업 알선형',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인턴 후 계속 고용 유도를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이다.
평균 보수는 30만~170만 원으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2018년 69.1%(35만5000명)에서 올해 73.4%(54만3000명)로 늘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2018년 20.8%(10만7000명)에서 올해 17.6%(13만 명)로 줄었다.
2년 사이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은 4.3%포인트 높아졌으나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3.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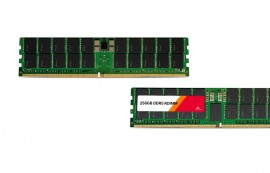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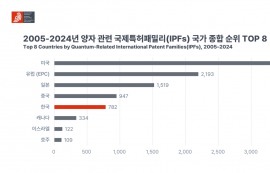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AI 거품 우려에 하락...한때 4만9000엔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80515474400644e250e8e18810625224987.jpg)
![[특징주] KRX 2차전지 TOP10지수 6%대 '급락'...하루만에 시총 1...](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1816155401634edf69f862c118235662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