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인프라부터 신산업, 금융·창업, 관광 분야까지 다방면 포함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교통·물류 인프라부터 신산업, 금융·창업, 관광 분야까지 다방면의 사업이 포함되면서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이 구체적인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덕도신공항·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가속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6890억 원의 반영이다. 수 차례 유찰과 지연을 겪었던 사업이지만 대규모 국비 확보로 적기 개항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상하단 도시철도(300억 원) △하단녹산선(370억 원) △대저대교(70억 원) △엄궁대교(320억 원) △장낙대교(100억 원) 등이 포함돼 서부산 교통망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부산항과 공항을 연계하는 국제 물류 거점 구축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창업 거점 육성…글로벌 금융도시 도전
AI·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 확장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70억 원) △AX 기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30억 원)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20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여기에 ‘해양·항만 AX 실증센터(3.6억 원)’까지 포함돼 부산의 신산업 생태계 확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문화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도 다각도로 지원된다. △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12억5000만 원), △낙동선셋화명에코파크(16억6000만 원), △아미산 낙조 관광명소화(8억1000만 원), △수상워크웨이(35억 원), △황령산 치유의 숲(18억 원), △영도 해양치유센터(20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부산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해양산업 미래 기반 강화
부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111억 원)’를 비롯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18억 원)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경쟁력 강화(49억 원) 등이 포함돼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가 전망된다.
국회 심사 과정이 마지막 관문
부산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최종 관문은 국회 심사다.
부산시는 국회 상주반을 가동해 연말 심사 종료까지 확보 예산을 지켜내고 추가 소요 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주요 사업이 대거 반영돼 글로벌 허브도시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남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미래 청사진 구체화 단계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 반영을 두고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평가한다.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이고, 금융·창업·신산업 분야의 예산 확보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확보 규모가 최종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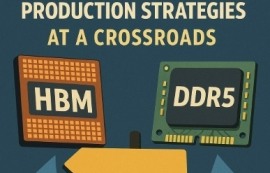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대폭 하락...한때 5만엔선 무너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80515474400644e250e8e188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