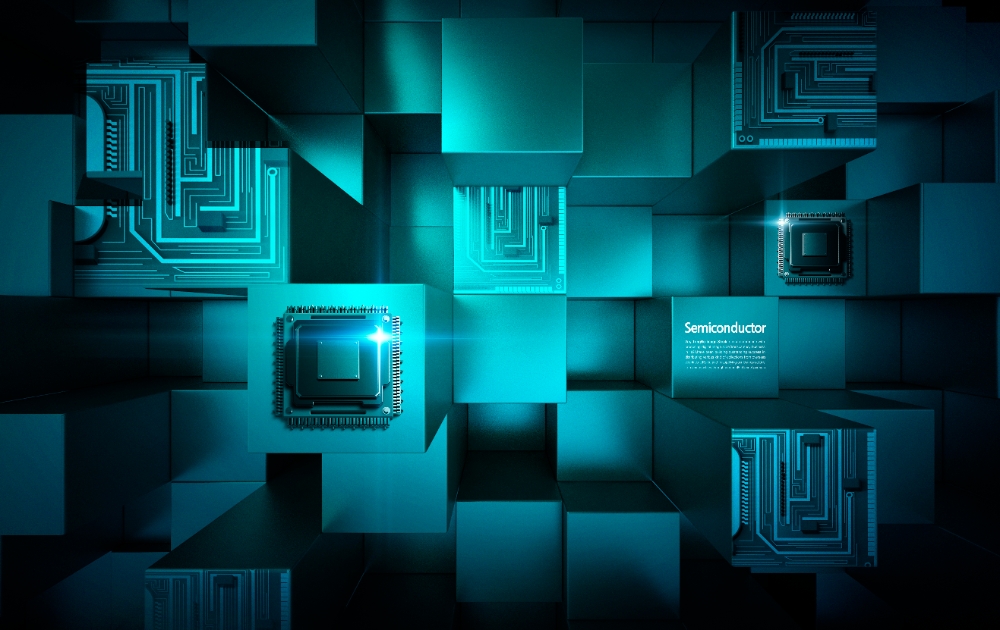시진핑의 칩 핵심기술 승리‧자급자족 공언에 '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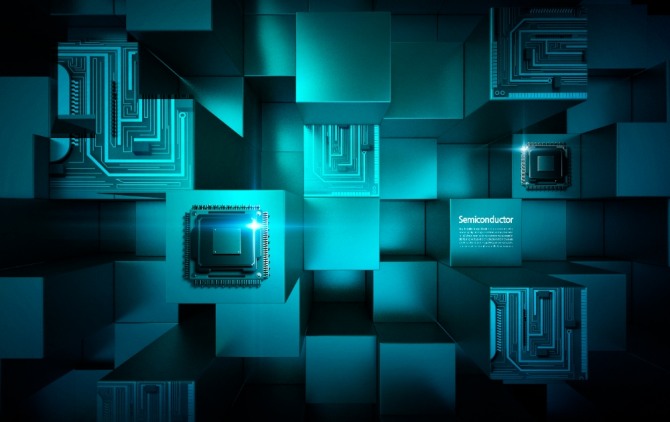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급자족을 강화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칩 개발 및 생산에 대한 노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한으로 인재가 고갈되면서 이 계획은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번 주 칩 산업 그룹 SEMI의 연례회의에서 UNISOC 회장인 우성우(Wu Shengwu)는 중국 모바일 칩 회사의 성장 계획에 대한 야심 찬 비전을 제시했다.
UNISOC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휴대폰용 칩셋을 생산하는 중국 팹리스 반도체 회사이다.
우 회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우리는 스마트폰 반도체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6세대 무선 핵심 기술에서 글로벌 표준에 따라 고급 개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UNISOC은 전 세계 스마트폰 칩 시장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만의 미디어텍(MediaTek), 퀄컴(Qualcomm), 애플에 이어 4위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첨단 6나노미터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 조치(행동)에 박차를 가한 진보(발전)의 한 예이다.
워싱턴을 행동으로 몰아넣은 발전의 한 예인 첨단 6나노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10월 미국의 새로운 규제가 발표된 이후 시진핑 주석은 “주요 핵심 기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술과 함께 미국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최신 조치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2015년 중국의 기술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그해 수요의 10%에 불과한 국내 반도체 공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스(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ies)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에 자체 반도체의 24%를 공급했으며 203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새로운 중국 반도체 억제책은 중국의 반도체 시나리오에 린치를 가했다. UNISOC과 같은 회사가 10nm 이상의 고급 칩 설계에 성공했지만 워싱턴은 중국이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노리고 있다.
제조 측면에서 중국 최고의 칩 파운드리인 SMIC가 14나노 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첨단 마이크로 제조 장비(Advanced Micro-Fabrication Equipment)는 5나노 정도 고급 반도체용 도구를 제공하는 반면 동종 업체 파이오텍(Piotech)은 10나노 이상의 고급 칩용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 워싱턴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생산 장비, 재료 및 기술 공급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한은 또한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를 심사 대상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는 다수의 미국 시민과 중국계 영주권자를 고용했다.
업계에 정통한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인력이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기업에서 시간을 보낸 뒤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대만 시민권을 가진 경영진은 이제 중국 칩 회사에서 이러한 역할을 그만두고 있다. 중국 당국자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의 뛰어난 인재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자인했다.
중국 주요 반도체 공장 장비의 20%만이 국내에서 조달된다. 중국이 칩 생산량을 늘리거나 선진 기술을 개발하려면 여전히 외부 장비, 기술 및 인력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은 군사용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생산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미국이 칩 분야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한, 중국보다 우월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 칩 부문은 산업 현대화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없이는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없을 것이다.
중국 반도체 산업 그룹의 고위 관리인 예톈춘(Ye Tianchun)은 10월 말 “반도체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