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30년 사이 36%→50% 급증...전문가 "나머지 90%는 경제적 영향력 미미“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무디스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고소득층이 미국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50%로, 30년 전 36%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은 연간 소득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 이상 가구들로, 주식시장 상승과 부동산 가치 급등, 사업 거래 반등 등에 힘입어 호화로운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경제학자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부유층 10%가 돈을 쓸지 말지에 달려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소비를 줄여도 경제 전체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 부유층 기대 심해지는 미국 경제
올해 2분기 미국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1.4%로, 지난해 거의 3% 증가에서 크게 둔화했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잔디 경제학자는 상위 20% 가구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다소 물러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위 80% 가계는 기본적으로 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춰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봉쇄 종료 후 모든 소득 수준에서 나타났던 '복수 지출' 시대와는 대조된다. 미 해군 직원들이 설립한 미국 최대 신용조합인 ‘네이비 페더럴 신용조합’(Navy Federal Credit Union)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했다. 신용카드 지출 증가는 주로 연간 소득 17만 달러(약 2억 35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올해 여름 더 높은 수수료로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내놨고, 모든 것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들은 하룻밤에 1000달러(약 138만 원)를 내고 즐기는 초고급 숙박 상품을 내놓고 있다. 포르쉐와 애스턴 마틴 같은 고급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경제 흐름 속에 가격 인상에 나선 최초 자동차 제조업체가 됐다.
◇ 중산층 압박 속 양극화 빨라져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들은 지출을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바꾸고 가능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하위 소득층 41%가 물가 상승을 주요 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은 반면, 상위 소득층은 32%에 그쳤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피치 레이팅스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태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놓쳐 신용 점수 하락을 겪고 있다.
주식시장도 소수 기업에 기대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시장은 인공 지능과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소수 기술·금융주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반면 나머지 S&P 500 지수는 간신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K자' 경제구조는 정상층과 하위층 사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세나 실직 때문에 물가 인상 우려 속에서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감소와 함께 추가 비용 증가나 소득 감소는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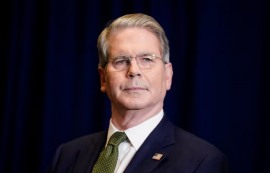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2104282502199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