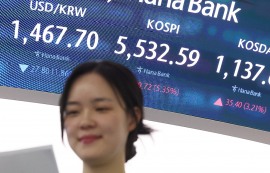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경제가 고용과 물가 안정 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민 다수는 여전히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각) 니르 카이사르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 “미국의 광범위한 계층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물가 국면도 상당 부분 진정됐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나 198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는 정반대다. 카이사르는 “미국인들의 경제 심리가 지금도 2008년 금융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비관적”이라며 “경제 지표와 체감 사이의 괴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미국 가계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들을 제시했다.
첫째, 실질 임금 정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임금은 오르더라도 집값, 임대료, 의료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필수 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둘째, 자산 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확대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를 보유하지 못한 서민층은 경기 호황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했다. 상위 소득층의 자산 가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고정 지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수 가계는 “경제 지표가 호조라고 해도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카이사르 칼럼니스트는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그러나 광범위한 계층이 더 이상 통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만한 소비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상실감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이 경제적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현실은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책 결정자들이 숫자만 보고 안주한다면 불평등과 정치적 분열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