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 성장 전망에도…통일 이후 첫 구조적 장기 침체 직면
1조 유로 재정 투입에 전문가들 "성장 약점 가리는 착시 효과" 경고
1조 유로 재정 투입에 전문가들 "성장 약점 가리는 착시 효과" 경고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유럽 경제의 심장부, 독일이 끝 모를 터널에 갇혔다. 2025년 실질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3년 연속 경기 침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닛케이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이어진 역성장의 사슬을 간신히 끊어내는 수준으로, 이는 통일 이후 처음 겪는 구조적 장기 침체 국면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1%대 성장률 회복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방비 증액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자리하고 있다. 막대한 나랏돈으로 숫자를 끌어올리는 경제 모델에 '전시 경제'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독일 경제의 근본 체력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메르츠 정권에서 경제 정책의 키를 쥔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독일 경제는 2019년 이후 제자리걸음이다"라며 "국민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의 발언처럼 독일 경제의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가 가을 경제 전망을 통해 내놓은 2025년 성장률 0.2%는 지난 4월의 제로 성장 전망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일 뿐,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서독 통일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함 독일 경제가 이처럼 좌초 위기에 놓인 데는 여러 원인이 겹쳤다. 자동차와 화학 산업을 양대 축으로 삼던 기존 성장 모델은 러시아산 저가 가스 공급 중단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두 암초에 동시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까지 겹치며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설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깊어지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1조 유로 투입…재정 확대로 '성장률 방어'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6년 1.3%, 2027년 1.4%의 성장률을 달성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메르츠 총리는 정권 출범 전 헌법까지 개정하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완화했고, 이를 통해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 유로(약 1667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 규모의 재정 지출 길을 터놓았다.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방위와 인프라 재정투자에 의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에 금융시장은 일단 좋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7년 독일의 실질 성장률이 2%에 육박할 것이라며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의 니클라스 가르나트(Niklas Garnath) 연구원은 "재정 확장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재정 지출로 '숫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부풀려진 성장률이 과연 건강한 회복을 의미하는지를 두고는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라이헤 경제장관 스스로 "(성장의) 대부분은 방위 투자와 같은 거액의 정부 지출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다. 이는 곧 민간 부문의 자생 회복 동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기차(EV) 전환에 고전하는 자동차 업계와 부품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어 개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 불확실성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 대표 싱크탱크인 Ifo 경제연구소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확장적 재정지출이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약세를 감추는 효과만 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기가 바닥을 친 것처럼 보여도 근본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남아있어 폭넓은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산업의 기본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소득과 고용 기반의 회복 없이 재정 주도 성장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노믹스' 닮은꼴…일본식 저성장 고착화 우려
실제로 독일 경제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경제의 '순항 속도'를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까지 0.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메르켈 정권 당시 1.5%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수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저성장 사회로 들어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의 활력이 떨어진 때에 재정 지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독일의 현주소는, 과거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내걸었던 일본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독일 자동차 대기업 폭스바겐의 지주회사 포르쉐 SE가 방위 산업 진출을 검토하는 등 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전환 움직임도 활발하다. 동부 작센안할트주의 슈테파니 페치 경제차관은 "비즈니스 거점 투자가 절실하며 도로, 교량에 대한 자금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독일 경제는 민간 주도의 성장 동력을 되찾느냐, 아니면 재정에 기댄 인위적 부양의 한계에 부딪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방대한 재정지출 중심의 '전시경제' 전략으로 중기 회복을 꾀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의 근본 체력 강화와 구조 혁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운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역시 독일의 이 거대한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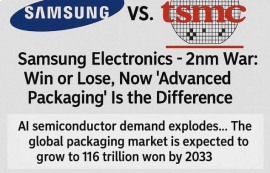


![[뉴욕증시] 빅테크주 강세에 3대 지수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1901075505815be84d87674118221120199.jpg)


















